가장 맛있었다. 이제까지 먹어본 짬뽕 중에서.
2010년도에 홍콩반점 짬뽕을 처음 먹어본 내 소감은 그랬다.
농담이 아니다. 웬만한 고급 중국집에서 내놓는 것보다도 한 수 위였다.

혀 위에서는 면발이 춤을 췄고…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유명 '몇 대 짬뽕집' 수준이 아니고서야, 시내에서 홍콩반점보다 더 나은 짬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감히 말하건대 백종원이 한국의 짬뽕 맛의 평균을 한 단계 올렸다.
백종원이 수많은 체인점을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은, 백종원 자신이 사업가이기 이전에 확실히 맛을 낼 줄 아는 ‘요리사’라는데 있다. 요리사 백종원은 맛이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도 잘 알고 있다. 마리텔이나 집밥 백선생에서 “A가 없으면 B로 하세요”라고 쉬운 조리법을 말해주는 것은 그가 음식에 담긴 맛의 핵심이 뭔지 알기 때문이다.
2012년 주간조선에서 김훈이 쉐프는 말했다. 요리라는 것은 과학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소갈비를 찔 때 오븐에 넣고 162.8도로 2시간 45분을 찐다. 그렇게 해야만 육질이 맛있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백종원이 이런 정석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가성비’가 좋은 조리법을 만들고,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생기는 빈틈을 조미료나 다른 양념 등으로 채운다. 재료 단가를 낮추고, 조리 과정을 단순화시키면서도 ‘비슷하게’ 맛을 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이는 공부를 '제대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위대한 집밥'에 어찌 감히…

재평가 받고 있는 소유진의 현명함 클래스…
이런 백종원이 인기있는 것은 당연하다. 맛있는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는 콘텐츠가 있다. 게다가 개인적인 매력도 상당하다. 이런 사람이 인기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지만 백종원 열풍이 왠지 불쾌한 ‘지식인’들은 자꾸 삐딱한 글을 쓴다.
최고의 재료를 숙련된 기술로 요리한 음식이 우리의 로망이라면, 최소한의 재료와 노동으로 ‘있어 보이는’ 식탁을 차려내는 것은 우리의 ‘니즈’(needs)다. 한국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백종원이다. 그러므로 백종원의 유쾌한 레시피는 하나의 백서다. 초과노동과 불황으로 ‘하얗게 소진된(burn out)’ 2015년 한국인 백서.
<집밥과 한국노동현실>, 박권일이들에게 텔레비전의 백종원은 ‘대체 엄마’이다. 맞벌이로 바빠 내게 요리 한 번 가르쳐준 적이 없는 엄마와 달리 부엌의 온갖 인스턴트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그러듯 약간 귀찮은 표정으로 잰 체하며 비법을 날린다.
<'백주부' 백종원에 열광? 맞벌이엄마 사랑 결핍 때문>, 황교익이런 의미에서 ‘백종원 현상’은 집밥의 부재를 보여준다기보다, 집밥의 계급화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누구나 먹던 그 집밥마저도 경제력에 좌지우지되어야하는 현실이 집밥 논쟁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황교익이 말하는 ‘엄마의 손맛’이 살아 있는 집밥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미 ‘평등의 고원'에 올라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한 이들을 보증하는 장식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더 정직한 사태 인식이지 않을까.
<집밥 논쟁에 대하여>, 이택광
위의 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현상이 백종원 개인의 역량이나 대중의 '니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핍’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한다. 무언가 현대인들이 부족하니까 ‘백종원 열풍’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이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해 먹인다”며 펄쩍 뛰는 말보다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위의 분석이 전부 터무니없는 이유는, 애초에 집밥을 하나의 이데아로 상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밥’을 '집에서 만든 밥'이라는 뜻 이상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양 믿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어머니의 집밥’이 이데아가 되어버리면, 백종원의 요리는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백종원이 의도치 않게 ‘집밥 선생’이 된 것이 이들에게는, 무언가 잘못되어간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재료를 숙련된 기술로 요리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전업주부’가 없는 집에서는 ‘집밥’의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이미지도 생성되지 못했다는 것도 모른다. 심지어 황교익은 '집밥 이데아'가 없는 상황을 결핍이라고 여겼다는 게 문제다.
의외로 엄마들이 조미료를 많이 쓰고, 매일 했던 요리만 하고, 요리를 못 한다는 사실도 이들은 쉽게 간과한다. 그저 이 모든 문제가 ‘2015년의 문제’이라고 여기고, 어떻게든 백종원 현상을 비극의 징후처럼 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백종원과 함께 그리는 새로운 '집밥'
그러나 이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백종원 현상은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보적인’ 일이다. 집밥을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편리하게 한다. 또한 ‘집밥 백선생’의 컨셉처럼 가사노동에 참여 안하는 남성들이 ‘음식’을 하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남자들이 부엌에서 우글우글. 종갓집 할머니가 봤으면 주걱 날아갔을 풍경이다. ⓒtvN '집밥백선생'
맞벌이가 보편화 된 환경에서, 힘든 저녁에도 간단하고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공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설탕을 왜 그렇게 많이 뿌리냐고 난리를 치지만, 백종원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취향 따라 조금만 넣으셔도 돼유~”라고 (그리고 나 역시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설탕이 걱정되면 밖에서 음식 사 먹지 마시길.)
그렇다면 당사자인 '주부'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난 7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 24년차 주부의 말을 들어보자.
백선생의 카레는 20여 년간 고집해온 내 카레 만드는 방법을 돌아보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6월 25일 저녁, 백선생이 방송에서 알려준 대로 카레를 했다. 남편도 아이들도 "맛있다, 맛있다!"를 거듭하며 싹싹 긁어먹었다. 이후 '백주부의 고급진 레시피'란 네이버 밴드에도 가입했고, 나보다 열렬한 팬인 아이들이 틀어주는 백종원 출연 방송들마다 열심히 보고 있다.
이 글을 보면 백종원은 주부들조차 깜짝 놀라게 하는 레시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집밥 백선생을 하는 날이면 그날 주제가 된 재료는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백종원이 이 프로그램에서 재료 고유의 특성을 살려, 어떤 방식으로 맛을 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A를 어째서 B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일반 요리 프로그램'처럼 딱딱하지 않고, 응용도가 높은 레시피와 명쾌하고 친절한 설명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전업주부 30년 차의 레시피보다, 백종원의 레시피가 더 우월하다. 그게 훨씬 과학적이며, 재료의 맛을 잘 살린다. 집밥을 이데아의 영역에 올려놓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조차 부정해버리니까, 자꾸 괴이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전 요리 한번 안 하던 아빠가 ‘백종원 레시피’로 만든 카레와 꽁치볶음을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정성이 깃든 집밥이 아닐까? 나는 집밥의 미래를 백종원에게서 본다.
박정훈
박정훈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백종원은 정말 ‘집밥’을 훼손하였나? - 2015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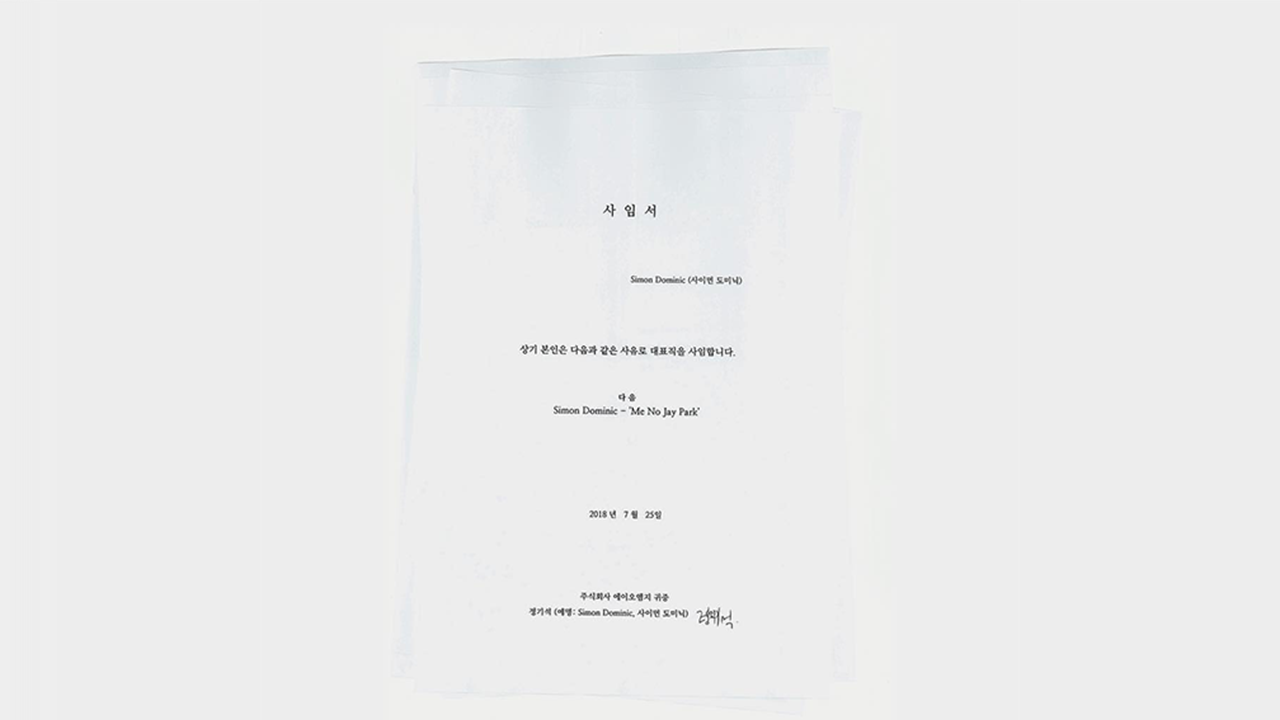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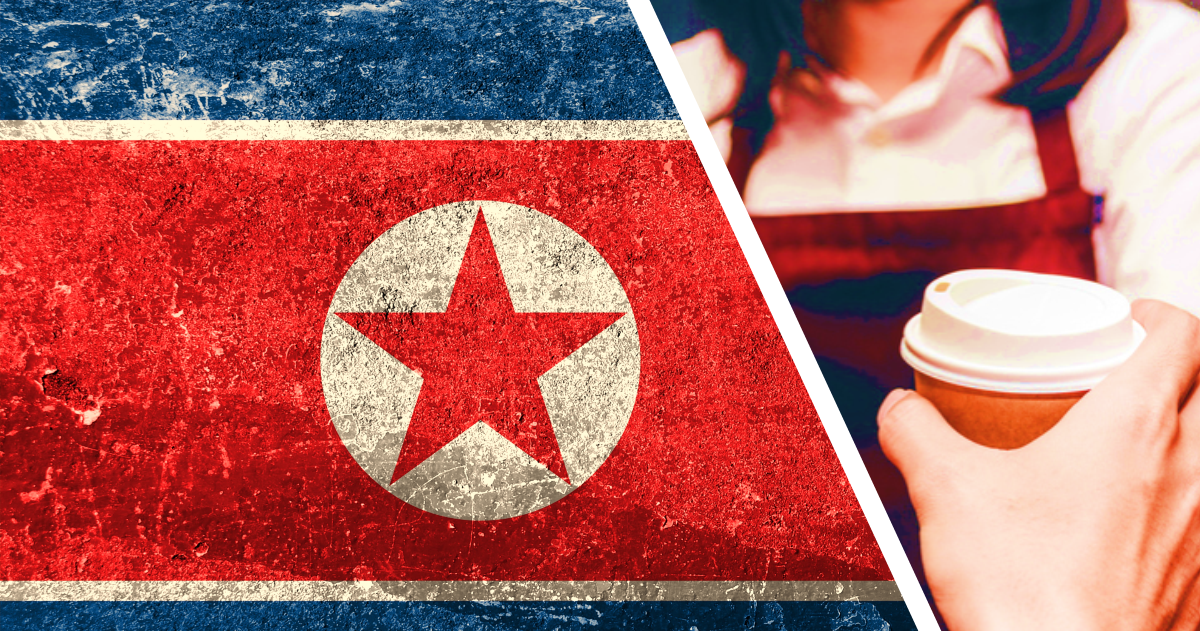

[…] 원문:?TWENTIES TIMELINE?/ 필자: 박정훈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