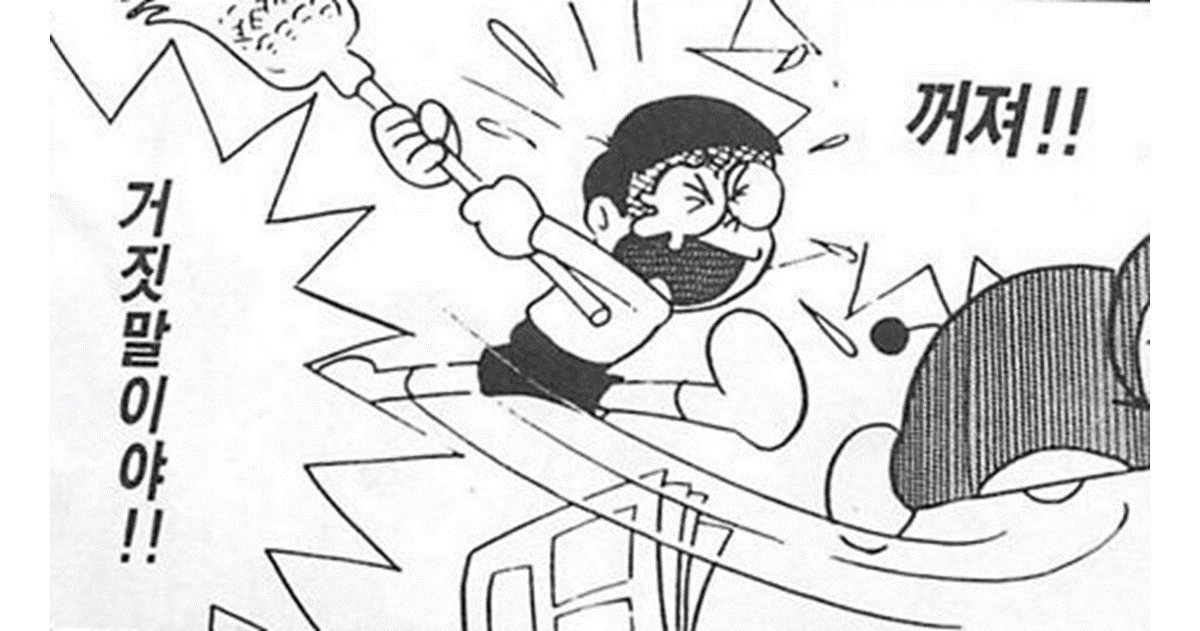역대급 연휴에 신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연휴가 끝나니 얼굴이 반쪽이 된 이들이 있다.
제사를 지낸 집들의 딸들이다.
20살을 훌쩍 넘긴 딸들이 보낸 올 추석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렇게 딸은 부엌데기가 된다
친가는 8남매의 대가족이다. 8남매와 배우자, 그들의 자녀들,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까지 모이면 방 세 칸이 전부인 시골집은 조용할 틈이 없다. 그저 시끄럽기만 할까. 며칠동안 대가족의 삼시세끼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박하지 않다...
결국 며느리들은 하루종일 부엌대기 신세를 져야 했으니. 우리집은 효심이 지극한 아버지 덕에 항상 명절 이틀 전에 친가에 내려갔다. 효도는 참으로 좋은 것이나, 아버지의 효심이 극에 달할수록 괴로워지는 건 엄마였다. 일찍 온 며느리 순대로 더 많은 밥을 내야했으니까.
이번 추석엔 예외적으로 추석 전날에 내려가기로 했다. ‘휴일을 좀 더 즐길 수 있겠구나!’ 조금의 기쁨을 누리려던 찰나, 큰아빠의 전화가 왔다. 큰엄마가 아파서 오지 못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 좀 더 일찍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덧붙였다. 밥할 사람이 없다고. 큰아빠는 큰엄마의 부재로 줄어든 ‘밥 차릴 노동력’을 우리 엄마에게서 찾았다. 큰엄마가 안 오면 큰아빠가 일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엄마를 찾을까?
마음 같아서는 친가 방문을 결사 반대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이미 부랴부랴 짐을 싸고 있었다. 결국, 나는 설거지를 자처했다. 어른들에게 예쁨 받고 싶어서도 아니다. 본래 심성이 착해서도 아니다. 내가 설거지를 한번 하면 엄마는 큰엄마, 작은엄마와 맥심 커피 한잔을 5분이라도 더 느긋하게 마실 수 있다.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설거지가 많다며 같이 하자고 기어코 싱크대 앞에 섰다.

나는 이게 다 설거지로 보인다
그렇게 엄마는 유일한 휴식인 달달한 맥심 커피 한잔을 포기했다. 수북이 쌓인 그릇들을 닦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차마 지울 수 없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섰다. 큰아빠, 울 아빠, 작은 아빠가 TV를 보며 쉬고 계셨다. 얼굴 마다마다 평안이 가득했고 기름이 넘쳐 번지르르했다.
사실, 어렸을 적엔 나도 아버지들과 같았다. 사촌들과 TV앞 리모컨 쟁탈전을 한참 벌이고 나면, 뚝딱하고 양념게장, 잡채, 갈비, 여러 전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한 뼘씩 키가 자랄수록 불편함도 으레 늘어났다.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게장의 고추 양념들을 버무리는 큰엄마. 질기디 질긴 홍어껍질을 벗기다 손이 베인 작은엄마. 종일 전을 부치다 식용유 냄새에 온몸이 절어버린 우리엄마...

실제로 이번 추석에 찍은 사진. 앉아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들의 모습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차 사촌언니와 나와 여동생은 엄마들 곁을 지켰다. 그러나 사촌오빠들과 남동생은 등을 바닥에 밀착시킨 채 핸드폰을 보며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뿐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랫세대인 자식들조차 여성만이 명절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
참으로 웃기고도 슬픈 것이었다. 언제쯤 이 비극이 끝이 나려나.
아마 명절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되겠지.
(글/ 찐퉁)
#아파도 아프다 할 수가 없다
한창 제사상을 차리는데 살살 배가 아파왔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욱신거리는 배를 붙잡고 고기 산적을 제기 위에 올렸다. 내가 쉬면 언니와 몇 달 전 무릎수술을 한 할머니밖에 일할 사람이 없지 않던가.
제사가 시작되고 남자들이 절을 올리자, 여자들은 그제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바로 식사준비를 해야 했지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눈을 붙이고 싶었다. 조용히 방으로 가 누웠다. 핑핑 돌던 눈앞이 깜깜해졌다.
누운 지 10분은 지났을까. 밥 차리라는 할아버지 목소리에 퍼뜩 일어났다. 게을러 빠져서 뭘 자고 있냐는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야단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부랴부랴 제사상을 치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식사준비, 과일깎기, 설거지···.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조금 괜찮아졌던 속이 다시 뒤집어졌다.

제사지내고 나온 설거지. 실화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도무지 먹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냥 굶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과일을 가져오라는 작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과일을 챙겨 나왔다. 원래대로라면 사과며 배며 가지런히 깎아서 내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언니는 아팠고, 할머니는 아직 식사 중이었다. 직접 깎아 드시라고 통 과일과 함께 칼을 가져다주었다. 이래본 적 없는데. 몸이 아파서 헤까닥 한지도 모르겠다.
“이게 뭐고! 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정말 아프다고. 아파죽겠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며 말끝을 흐렸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꾹 눌렀다.
병원에 오니 장염이랬다. 기름진 음식 조심하고 푹 쉬란다.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다ㅠㅠ
음식은 조심할 수 있어도 쉬는 건 못하겠네요. 속으로 빈정거리다가 문득 엄마가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항암치료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손을 대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는 엄마는 명절이 되자 서슴없이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다. 그 손으로 음식도 했지만 친할아버지의 군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떨어지는 수액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다.
푸근한 한가위라는데, 피로만 푸짐하게 남은 한가위다.
(글/ 진쨩)
#늙은 종부의 고집
내가 기억하는 20여 년 동안의 명절이나 제삿날의 모습은 늘 지긋지긋하게 똑같았다. 한옥 부엌과 뒷마당에선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직접 닭도 잡고 나물도 캐고 만두피까지 만들어야 하니 꼬박 하루가 걸렸다. 방에서 놀긴 눈치 보이고 부엌에 있자니 심부름하기 싫었던 어릴 적 나는 자주 잠든 척을 했다. 방에 짐을 풀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실눈 뜨고 보곤 했다.

실눈 사이로 본 그곳은 총성없는 전쟁터였다...
마루와 방에 모여 계셨던 집안 어르신들과 남자들은 새벽이 되면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서나 봤을 것 같은 옷을 입고 곡을 했다. 둘둘 말린 한지에 쓰인 무언가를 읽기도 하고 곡소리만 울리는 적막 속에서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할머니와 엄마는 며칠 간 온몸이 쑤셨다.
우리 집안엔 이런 제사가 1년에 스무 번이 넘는다. 그리고 처음 시집온 18살 때부터 70년 가까이 제사를 다 모셔온 분이 바로 우리 큰할머니다. 하지만 3년 전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자식들은 도시로 이사를 가고 제사도 간소화할 것을 권했다. 모두가 찬성했다.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바로 큰할머니 본인이었다.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네 웬 고집이냐며, 자식들은 큰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계속되는 권유에 큰할머니는 지팡이를 탁 놓으시며 주저앉으셨다.
“하이고, 그럼 이제 나는 죽어도 되겄네. 아무 짝에 쓸 데가 없겄네.”
울음이 섞인 격앙된 목소리였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글자도 모른 채 열 여덟에 시집 와 집안일밖엔 할 줄 모르는 여자. 자식들을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는 동안 그녀의 총명한 눈빛은 흐려졌고 호탕한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사만은 놓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제사일까
그런 그녀를 보고 집안 어르신들은 ‘이래야 우리 집안에 뼈를 묻는 종부’라며 치켜세웠다. 그 사이 큰할머니에게 제사는 자신이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일,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쉬이 입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큰할머니는 이사를 가셨다. 하지만 제사는 그대로 모신다. 제사에 올 수 있는 어르신들이 차츰 줄어들고 직접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을 마트에서 사는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때마다 큰할머니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위풍당당하게 주방을 자휘하신다.
이 슬픈 풍경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글/ 헌뚜니)
Twenties Timeline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누군가의 ‘죄송한 죽음’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 - 2018년 5월 28일
- [9th 모집 D-DAY] 어떤 대학생이 1년이 넘도록 트탐라를 하는 이유 - 2017년 12월 29일
- 가깝고도 낯선, 가족이라는 그 이름 - 2017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