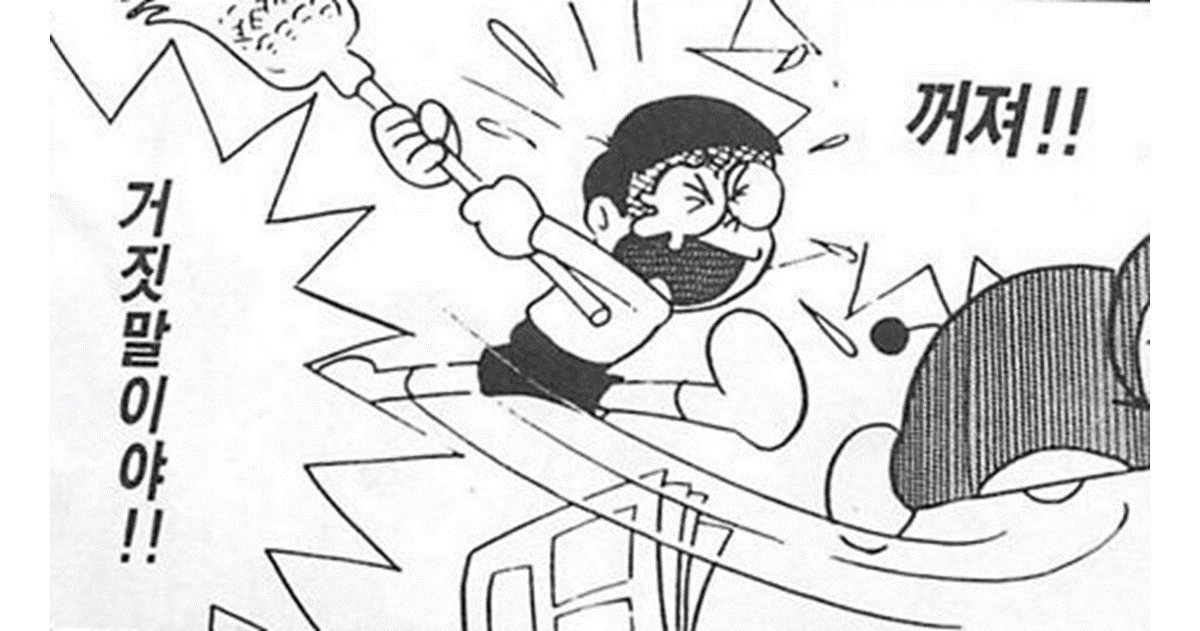변절자들은 말한다. 그 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맞다. 누구든 한번쯤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신의 안위가 먼저 생각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개개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모이면 ‘우리’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을 억지로 끼우려고 하면 전체 그림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 다행인 건, 그럴 때마다 옳은 모양은 이래야 한다고 외칠 줄 아는,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몇은 있어 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곪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줄 아는 누군가가 있길 우리는 바란다.
드라마 <아르곤>의 김백진(故 김주혁 역)은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고장 난 사회적 안전장치들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현실에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있을 거라 믿고 싶은 언론인, 선배, 한 사람으로서 김백진은 존재했다. 필자를 비롯한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인생 캐릭터’가 되었다.

기자는 영웅 되서는 안 된다.
그저 제가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다.
다른 기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판단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 거다“
김백진은 ‘제대로 판단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이라고 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며 진실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가 밝혀내고 전달하려 한 드라마 속 진실은 우리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고 언론은 이를 도왔다. 다친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팩트가 아닌 걸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보도를 자행하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그들과 한 편이 되어 뉴스와 시청자들을 주무르려는 언론의 모습 역시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경찰 확인 없는 반쪽 특종 빨아주느니 내 의심을 믿겠다”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김백진의 모습, 회사와 상사의 압박에 대항하여 진실 보도를 강하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그의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를 가장 ‘언론인’답게 한 것은 틀린 걸 인정하고 바로 잡는 용기였다. 진실을 캐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끝내 바로 잡아내는 것이란 걸 보여줬다.
언론인 김백진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진실 보도의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들이댔다. 언론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김백진이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라는 손석희씨가 그에게 ‘일종의 연대감’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널 기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기억하는 내 마지막 모습도
기자였으면 좋겠다.
김백진은 아르곤 팀의 후배들에게 ‘싸이코’라고 불린다. 제대로 된 팩트를 좇지 못하는 후배들을 매섭게 다그치는 모습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되는 필자는 살면서 저런 선배를 단 한 명만 만나도 큰 행운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극중 김백진은 후배들에게 굳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제대로 된 언론인의 길을 보여주는 선배다. 그 길을 따를지 다른 길로 갈지는 선택의 문제일지라도 처음 가는 길 앞에 저리 올곧고 믿을 수 있는 선배가 있다면 덜 막연하고 덜 두려울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의 성장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는 후배들을 믿어주기도 한다. 맨날 혼나고 고생하더라도 이 조직에 개개인이 꼭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고 한 팀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후배들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러니 후배들은 싸이코라고 부르면서도 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밖에.
 우리도 보호막이었다.
우리도 보호막이었다.
근데 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
김백진은 아무 흠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다. 미처 귀 기울이고 살펴보지 못한 팩트들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기도 한다. 함께 하는 팀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 뿐인 딸에게도 좋은 아빠 노릇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이다. 틀린 보도는 바로 잡고 상처를 준 상대에겐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민다. 후배는 북돋아주며 딸과 친해지고자 계속 다가간다.

필자는 그가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는 이유가 그의 대사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일흔 한 명이야. 사회 보호막이 되어야 할 사람들 중 누구 하나라도 눈 똑바로 뜨고 있었으면 죽지 않을 목숨이. 우리도 그 보호막이었다.미드타운이 세상 하나뿐일까? 사회의 안전장치가 전부 고장 나있는데. 나를 해치는 기사라고 덮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망가진 그 시스템의 일부일거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
그는 아르곤이라는 언론이 본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맡은 역할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언론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아르곤을 끊임없이 성찰한 거다.
선배로서도, 팀원으로서도, 아빠로서도. 김백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맡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했다.

그러니 김백진은 단순히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진 캐릭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에 분명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필자는 인생캐릭터로 자리 잡은 <아르곤> 속 김백진을 오래도록 보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김백진의 삶을 시청자에게 보여준 故 김주혁씨의 죽음은 마치 잘 알고 지내던, 존경하던 사람의 죽음처럼 비통하게 느껴졌다. 기사를 접한 많은 이가 그랬듯 이 뉴스가 오보이길 바라며 멍하게 클릭만 했다. 그가 연기한 김백진처럼 故 김주혁씨 역시 매 순간 자신이 맡아온 많은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네가 기억하는 내 마지막 모습도 기자였으면 좋겠다”는 김백진의 말처럼 사람들은 그를 사랑받아 마땅한 배우이자 예능인, 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의 죽음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그가 보여준 김백진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자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헌주
박헌주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여돌을 좋아하는 나는 오늘도 괴롭다 - 2018년 3월 28일
- 양현석, 그에게서 익숙한 꼰대의 향이 난다 - 2017년 12월 26일
- 지금의 언론에 필요했던 ‘아르곤’의 김백진 - 201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