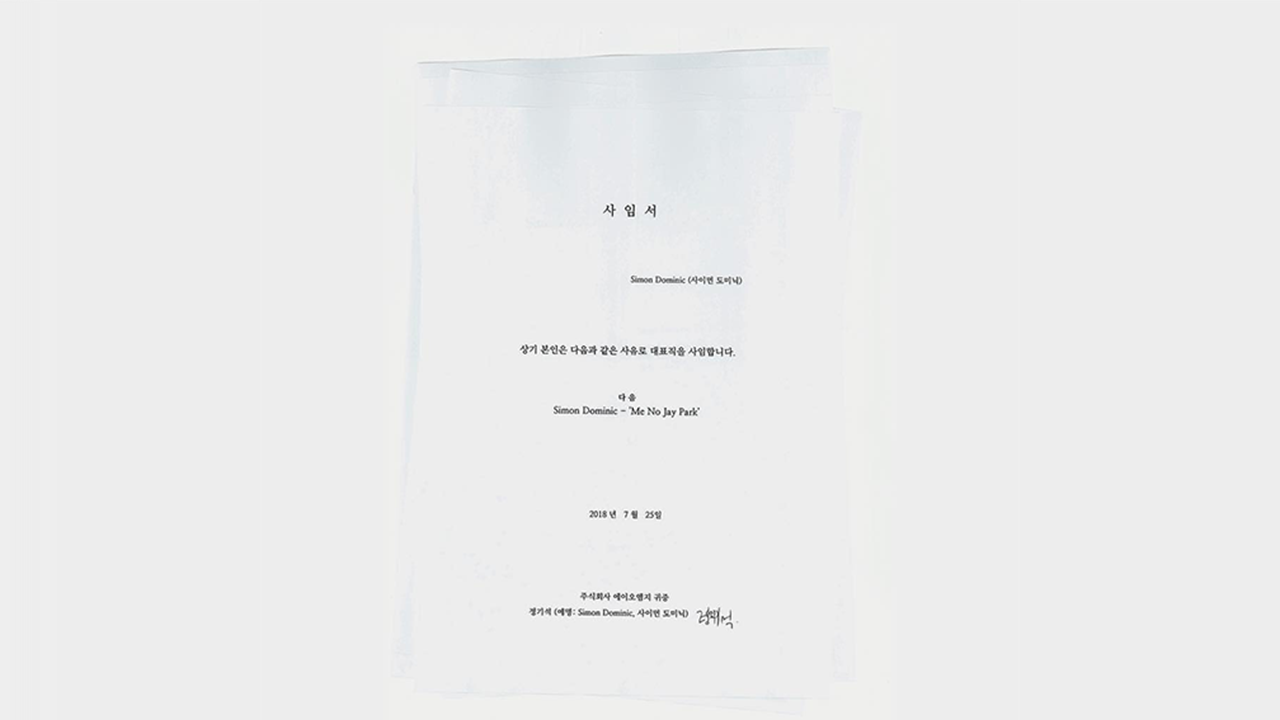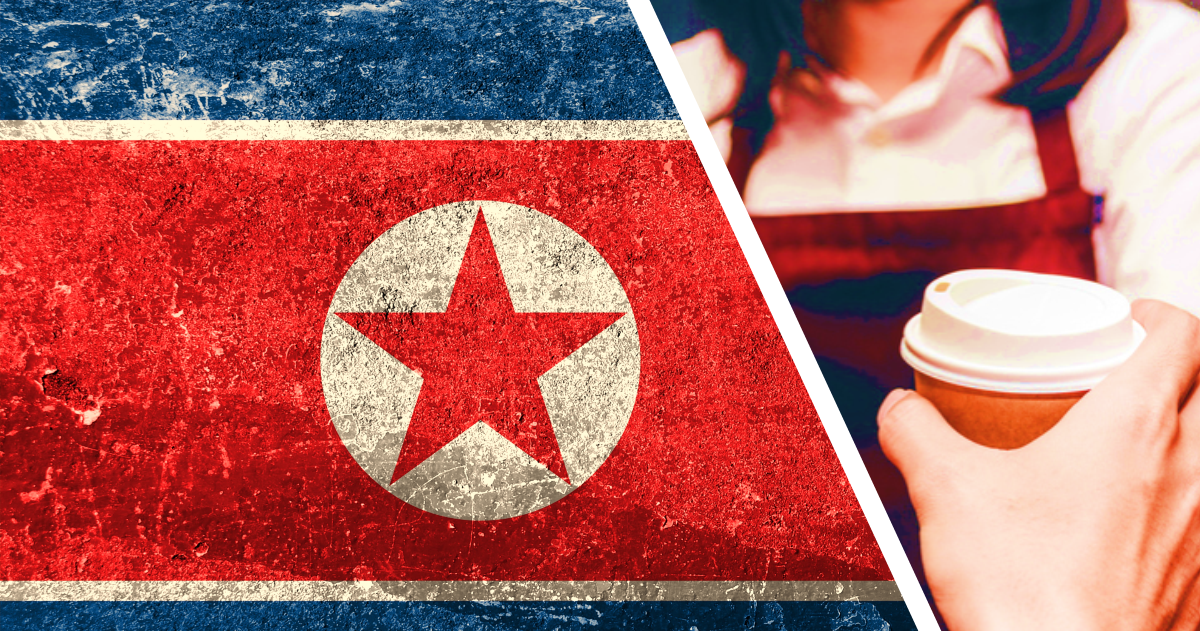2014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이름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 앉았다. 진상은 불투명했고, 갖가지 의혹이 생겨났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재발방지대책과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직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에 대한 연민이 냉대로 바뀌었을 뿐.

“지겹지도 않나? 자식 팔아 돈 달라고 떼 쓰는 거지 뭐.” ⓒ오마이뉴스
자식의 죽음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느냐는 이야기는 그들의 귓가에 맺히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자식과 돈이랑 바꾸는 일이 가능하냐는 반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박탈당한 단어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언어’를 박탈 당했다. 이제 ‘세월’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나의 DNA에 새겨졌으며,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침몰해 가던 그 배를, 유가족들의 눈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몸은 움찔거렸고, 또 들을 때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이게 되었다 ‘통제’라는 말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어떤 통제'에 따르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를 통해 똑똑히 확인했으므로. 그 '통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스스로가 너무나 무력한 것을 발견했으므로.

세월호 이후 몇 주 뒤에 일어난 지하철 충돌사고.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학습효과를 선보였다. ⓒ뉴스1
뿐만 아니다. ‘침몰’이니 ‘선원’이니 ‘배’니 ‘항로’니 하는 비유도 도통 쓰기 어렵게 되었다. 쓰다가도 지우고, 뱉었다가도 주워 담았다. 가장 좋아하는 밴드인 검정치마가 항해를 소재로 노래한 2집을 듣다가도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지곤 했다. 그렇게 세월호는 어떤 말들을,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비장하게 만들어버렸다.
수백 명이 눈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그 죽음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차라리 그렇게, 침묵을 택했다.
계속되는 단어의 약탈
그리고 보수적 가치와 팩트를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 그들이 쓰는 말은 감기처럼 전염성이 강했고, 그만큼 더 많은 단어를 전략적으로 앗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노’라는 경상도 방언의 어미는 지역민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었다. 방언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일베충’으로 몰린 경험이 있던 내 친구는 더 이상 웹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않게 되었다.?홍어라는 말은 어떠한가. 나는 이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가지런히 담긴 음식을 떠올리기 힘들다. 대신 민주화 항쟁에서 죽어간 이들과,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의 얼굴을 먼저 연상하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재미없음을 나타내는 버튼에 ‘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것의 본래 가치를 조롱했고, ‘오뎅’ 이란 말의 숨은 의미는 끔찍하여 언급하기도 두렵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속절없이 빼앗겼다.

아직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남았다고?
빼앗긴 단어의 자리에도 봄은 오는가
세월호는 수백의 희생자를 내고도, 사건 발생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어떤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비극’이고, ‘사건’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에 하나의 문장을 더 올리고자 한다.
"돌아오지 못한 단어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얼마나 더 빼앗겨야 하는가. 어떠한 말들을 더 죽여야 하는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어떤 '침몰된' 단어도 되찾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가 빼앗길 것들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약탈을 막기 위한 신호탄은 우리 앞의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인양' 될때야 비로소 박탈당한 단어들도 우리에게 온전히 돌아올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쓸 수 있는 말이 줄어드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어떤 문장을, 어떤 단어를 또다시 속절없이 빼앗기기 전에?나는 온전히 말을 하고 싶다.?다만, 그뿐이다.
이찬우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관계의 법칙 : 실패의 책임은 언제나 공평하다 - 2017년 11월 17일
- 기말 공부하다 말고 지난 총학 되돌아본 이야기 - 2015년 12월 15일
- 당신을 찌르는 송곳이 미우시다면 - 2015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