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로, 선배를 대하다
2011년 2월의 나는 '대학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자유, 존중, 자율, 정의, 민주. 뭐, 이런 슬로건에 걸맞는 문화와 열린 이성 따위가 날 두팔 벌려 반겨 줄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의 이 기대는 입학식도 아니고 첫 수업도 아니며 학회나 동아리도 아닌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다.
새터 첫 날, 선배 몇 명과 새내기 몇 명이 조를 이뤄 활동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대뜸 08학번 쯤 되는 남자 선배 한 명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뭐 불편해?"

아니아니 새터가 힘들어서…
"말 놓아도 괜찮지"라는 뻔한 말 하나 없는 명백한 하대였다. '선배로서의 권위'에 눌린 나는 그저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아뇨 ㅎㅎ 괜찮습니다 ㅎㅎ"
감히 후배 주제에, 어찌 감히 선배에게 대들겠는가. 이윽고 술자리가 시작되었고, 그 선배는 인심 쓰듯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마~"라고 말했지만, 감히 '그' 선배가 따라주는 잔을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새터의 두 번째 날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였다. '남자' 선배들이 '남자' 새내기들을 집합시켰다. 선배들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왜 굳이 남자만 불러 모았는지, 여자 동기들은 인사를 되게 잘했나보냐는 잡생각도 잠깐, 쌀벌한 분위기에 곧장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옷이라도 입으셨으면 정말 90도로 인사했을텐데…
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배들이 누군지 다 어떻게 알아보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대학생활을 초장부터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닥치고 있을 수밖에. 그리고 남은 새터는 - 술자리 예의, 선후배 간의 위계, 그리고 학과와 학문에 대한 선배들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내가 학교 몇 년 다녀봐서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학교를 너희보다는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학교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절절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곳에는 이성도, 학문을 배워가는 이들 간의 존중도 없었다. 그냥 조금 먼저 태어나신 분들의 찌질한 꼰대질만이 있을 뿐.
선배로, 후대를 대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교양수업에서 한 후배와 함께 발표를 할 일이 있었다. 그 후배는 "말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고, 나는 "존댓말이 편합니다."라고 답했다. 그 후에 그 후배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게 눈에 보였다. 아마 내가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
친구에게 이런 일화를 털어 놓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후배를 존대하는 건 옳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상대와 내가 친해지는 걸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단순하게 처음보는 후배와 친해지기 위해 스스럼없이 "형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하여 청소년인권운동가 공현은 '나이주의' 사회에서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나이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거나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우열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옳게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학번도 그럴 것이다. 내가 고작 1년 정도 먼저 대학교에 들어와 있었을 뿐이다. 나는 결코 내 후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며, 단지 내가 학식을 몇 끼 더 먹었다는 사실이 그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
수업이 비는 공강. 할 일이 없어 들어간 어떤 수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친해지더라도 계속 존댓말을 쓸 것 같습니다.
말을 놓고 나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학생으로서 존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한 번 말을 놓고 나면, 존댓말을 할 때는 하지 못했을 말들도 더 '편하게' 하게 되더라. 이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편함'이 결국 그를 '존중'하기 어렵게 만들곤 했던 것이다.
어떤 편함. '말을 편하게' 하라던 후배에게 나는 '존댓말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은 존댓말이 더 '편할'리가. 길어서 말 하기엔 혀 아프고, 타이핑하기에는 손가락이 아프다. 반말과 하대는 사실 편한 일이다. 나는 그 편함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 편함이 우리의 관계가 평등하지도, 수평적이지도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존대하는 불편함이 편하다. 혀가 좀 더 아프고, 손가락이 더 아플지라도.

가끔은 답답하고 느리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것 처럼
당신이 나의 후배이건, 선배이건, 나와 열 살 차이가 나건, 스무 살 차이가 나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존중하고 싶다. 몇 끼 더 먹은 학식이 나의 권위를 만들어주지는 않으므로. 그것이 우리가 평등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대할 것이다.
이찬우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관계의 법칙 : 실패의 책임은 언제나 공평하다 - 2017년 11월 17일
- 기말 공부하다 말고 지난 총학 되돌아본 이야기 - 2015년 12월 15일
- 당신을 찌르는 송곳이 미우시다면 - 2015년 1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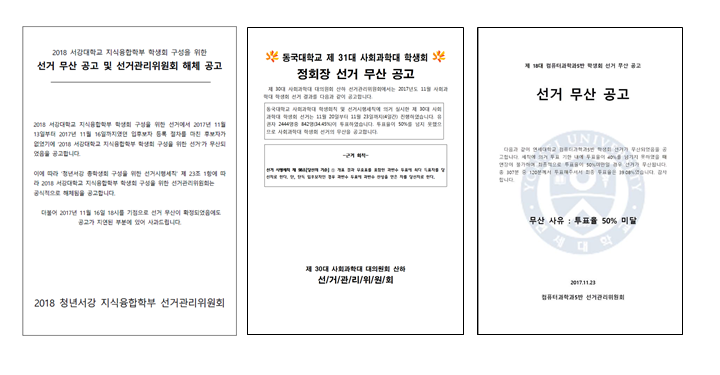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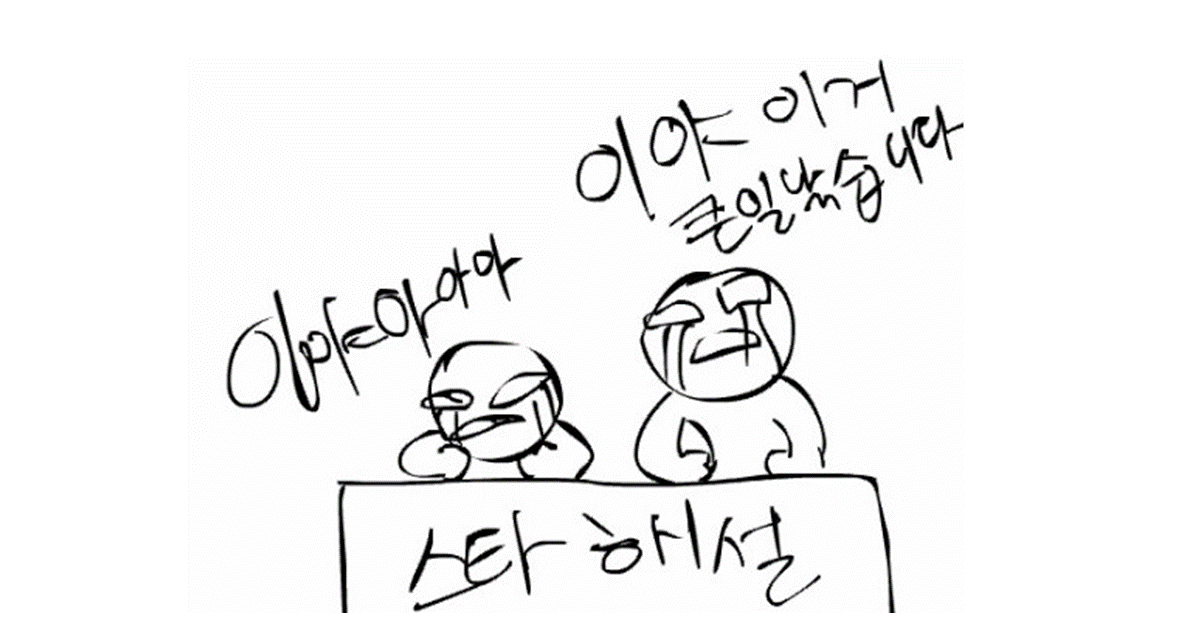
[…] 꼭 서로의 나이를 가지고 위아래를 규정해야만 뭐가 편해지는 걸까? 평범한 생일자들 중에서도 나이주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물며 언제나 ‘족보 브레이커’로서 경계를 떠도는 나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