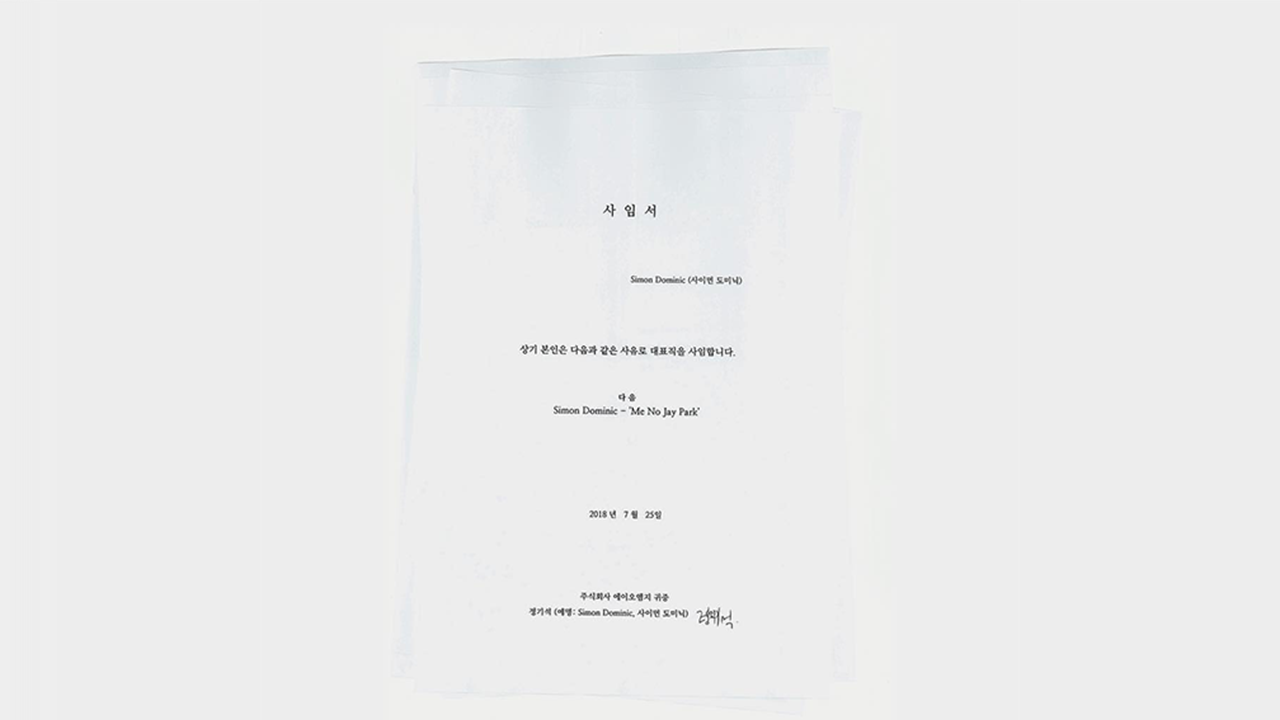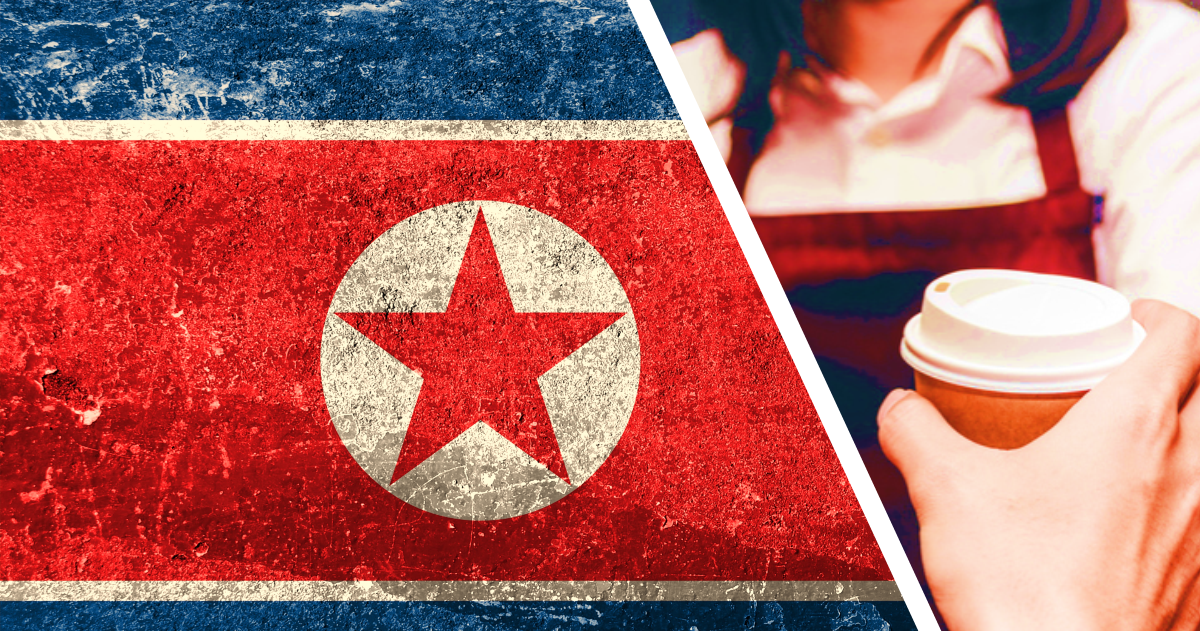어딜 가든 상담이 넘쳐난다. 가히 ‘대상담시대’라고 불릴만 하다.
그만큼 ‘잘 팔리는’ 아이템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도 떠오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담,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너의 곡소리가 안 들려
간략하게 말하라. 조언을 피하라. 성급한 문제해결을 피하라. 적극적 경청을 하라… 모두 '상담의 원칙'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내담자를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참조 : 비에스텍의 사회복지 실천 7대원칙) 하지만 상담을 간판에 건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자면 원칙은 커녕 고민을 고민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듣기’의 영역이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속에서 내담자는너무 적게 말하고, 패널과 MC 등의 상담자는 너무 많이 말한다.

요즘은 의리로 볼 때가 많아요… ⓒ JTBC '마녀사냥'
JTBC의 <마녀사냥>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5월 1일, ‘너의 곡소리가 들려’ 에 소개된 사연은 패널들의 수다를 포함해 총 4분 20초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떠드는 시간은 9분 내외. 고민을 듣기에도,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같은 방송사의 <비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27일 방영된 “영재교육을 시키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편을 예로 들면,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되는 시간은 약 40초.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패널들이 ‘토론’하는시간은 40여 분 이었다.
내담자의 고민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다. 여기에 내담자(사연을 보내 온 시청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점도 문제가 크다. 남은 것은 '사연'이 아닌 제작진의 입맛대로 편집된 아이템 뿐이다. 과연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실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분위기일까.
연애 전문가는 있어도 상담 전문가는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전문 카운슬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인생에서의 선배’ 혹은 ‘연애경험이 많은 오빠’들과 같은 소개는 친숙할 뿐 그것이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문카운슬러와 함께 하는 방송이 아닌 이상 이 시대의 상담 프로그램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연장선, 혹은 그냥 입담 좋은 방송인들의 덜 나쁜 꼰대질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문가도 아닌 그들은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린다. 아, 그건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라며 잘잘못 가리기는 예삿일이며, 썸남/썸녀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고(마녀사냥),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평가(비정상회담)하시다가, 심지어 나의 고민이 고민인지 고민이 아닌지까지 판단(안녕하세요)해주시겠단다.

아주 전문가이신가봐요 ⓒ 엠넷 '언프리티랩스타'
그렇다면 이들의 확신은 정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마녀사냥>의 인기코너였던 ‘그린 라이트를 켜줘’에 대해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인 이가 42.95퍼센트, 제일 낮은 이가 25.35%였다. 두 번중 한번은 적중하지 않는 상담코너에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고민은 결국 꽁트로 기능할 뿐이다. 그냥 보고 웃어 넘기기 위한 예능에 뭐 그리 진지하냐고? 오케이. 좀 더 가보자.
<비정상회담>에서는 외모지상주의(42화), 세대 차이(20화), 결혼(7화), 스펙쌓기(11화)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사람(6화), 차별이 느껴져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22화)까지, 상당히 진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회적인 쟁점을 다룬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고 토론할 것을 패널들에게 종용한다. 이 패널들의 판단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비정상’이라고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논의될 추가적인 자리는 없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논의는 언제든지 강인의 발언같은 문제를 부를 수 있다 ⓒJTBC '비정상회담'
<안녕하세요>도 같은 맥락이다. 제작진은 매번 MC와 패널, 그리고 방청객들이 내담자의 사연을 듣고 그것이 단순히 '고민인지 아닌지' 이분법적으로 투표하게한다. 아무도 그들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는다. 그렇게 굉장히 사적이고 많은 가치판단이 오갈 수 있는 누군가의 사연은 공공의 투표에 의해 판단된다. 몹시 '민주적인'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고민들은 경쟁까지 한다. 더 심각한 고민, 아니 이게 더 심각한 고민. 그 와중에 이 고민은 고민도 아니네, 까지.
이런 식의 '싸움'이 고민을 안고 있는 이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도 줄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님 앞에서 소중한 고민들은 오늘도 열심히 경쟁합니다 ⓒ KBS '안녕하세요'
웃자고 보는 방송에 선비질 하자는게 아니라
물론, 모든 ‘상담’이 전문 상담가만의 것은 아니다. 가끔은 소주 한 잔과 나누는 동네 형의 위로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는 것 처럼 말이다. 다만 동네 형은 내 고민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마찬가지로, 상담에 있어서 비전문가일수록, 내담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 할’ 필요가 있다.
예능이라는 특성 상 위와 같은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보고 싶다. 방송의 재미를 위한 사연의 각색을 최대한 줄이고,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것과 같은 것들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만약 이런 노력조차 없다면 그 방송들이 계속해서 ‘상담’ 이라고 불려도 괜찮을까?

'상담'의 상은 상처(傷)가 아니라 보조(相)를 의미한다 ⓒ JTBC '마녀사냥'
이찬우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관계의 법칙 : 실패의 책임은 언제나 공평하다 - 2017년 11월 17일
- 기말 공부하다 말고 지난 총학 되돌아본 이야기 - 2015년 12월 15일
- 당신을 찌르는 송곳이 미우시다면 - 2015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