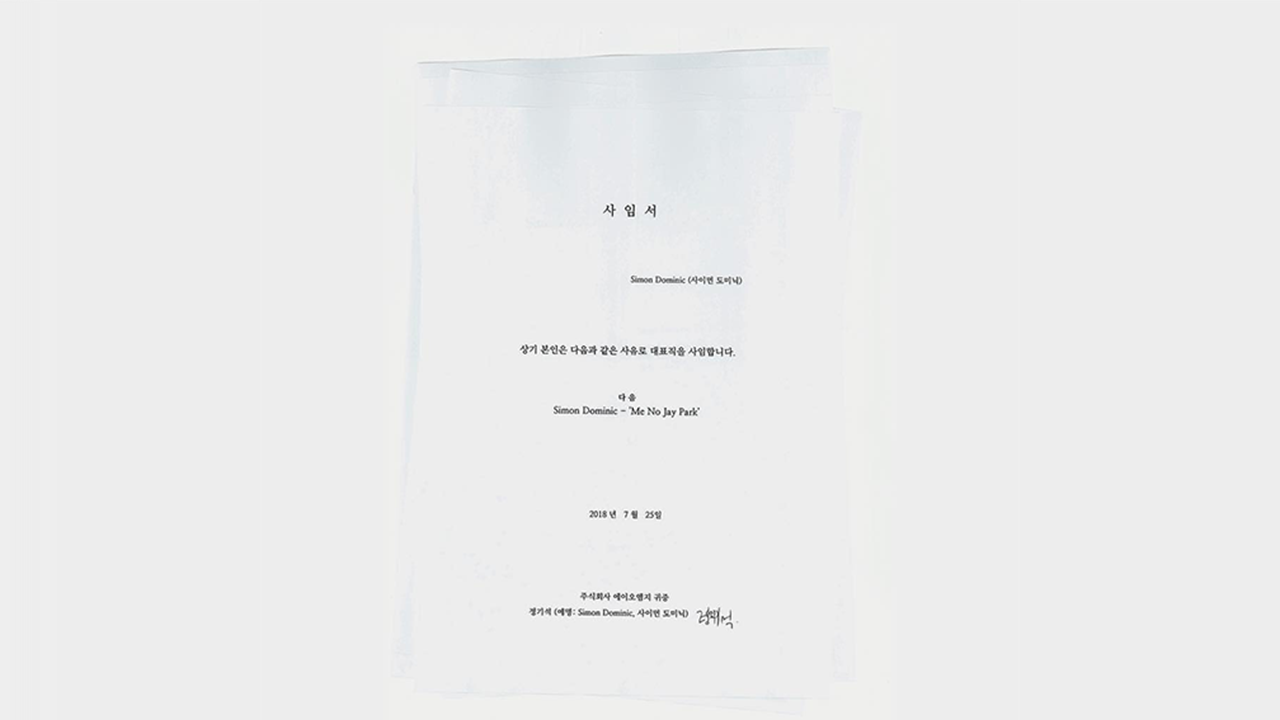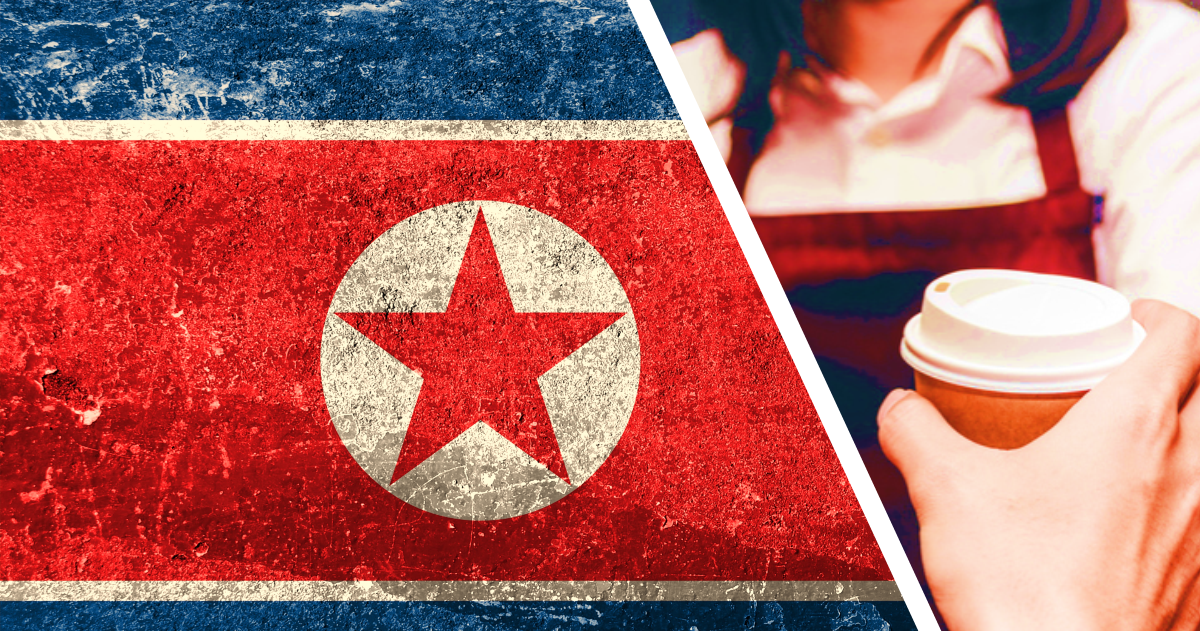지난 1월,?한겨레21에 한 엄마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아이 친구의 엄마’와 사귀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학부모끼리 친구가 되어야 하냐는 의미다. 별 걸 다 물어본다 싶었다. 내가 싫으면 싫은거 아닌가? 그러나 내 예상은 금방 빗나갔다.

“아이 친구들의 엄마 네트워크 정말 중요한가요?” ⓒ한겨레21
답변자는 억지로라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라며?충고하고 있었다.?너무도 진지한 말투였다. 이유인 즉슨,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테니, ‘독야청청 고립무원’으로 사는 것보다 엄마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 아이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특히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엿본 기분이었다. 순진하게도 너무 진보스러운 대답을 기대했던걸까? 아니, 어쩌면 이 답변이야 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한국 사회의 정석일지도 모른다.
올해 초 방송된 SBS스페셜 ‘엄마의 전쟁’ 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을 나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나왔다. 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은 오직 '엄마' 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당신은 엄마냐, 아니면 여자냐’라는 물음 또한 여성 출연자에게만 주어졌다.

한 인간의 일방적인 희생은 ‘엄마’라는 이름 아래서 당연하게 취급된다 ⓒSBS스페셜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엄마에게도 엄마가 되기 전의 인생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당연한 말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게 된다. 나랑 맞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생판 남하고도 억지로 친해져야 한다. 왜?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야 하니까.‘엄마’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 모든 행위들은 결국 아이를 위한 어떤 의미를 지녀야만 하니까. 엄마가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환상 속의 얘기나 다름없다.
헌신적인 모성애가 멋있고 대단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나이가 들었다. 결혼이란 게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게 되면서부터야 비로소 그 무게가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는 ‘좋은 엄마’가 지니는 무게는 상당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누가 날려주지 않는다면 엄마는 날 수 없는걸까? ⓒ금호아시아나
누군가는 막상 엄마가 되고 나면 달라진다며, 나의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키우셨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단순히 엄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달라진 건지, 아니면 나의 어머니께서도 “엄마”가 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힘겹게 포기하셨던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후자라면, 난 잘 모르겠다. 과연 내가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다. 더 솔직히 말해, 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언젠가 아이를 위해 내 삶과 나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또 제기됐을 때, 그때는 “굳이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이 상식이 될 때 까지, 아무래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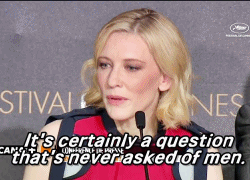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절대 받지 않죠"
최희선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아빠_옷장에_관심을_가져보자 - 2016년 12월 12일
- 무소유의 삶 ~노트북을 잃은 첫 7일간의 대격정~ - 2016년 9월 20일
- 노트북을 도둑맞은 당신이 당장 해야 할 다섯 가지 - 201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