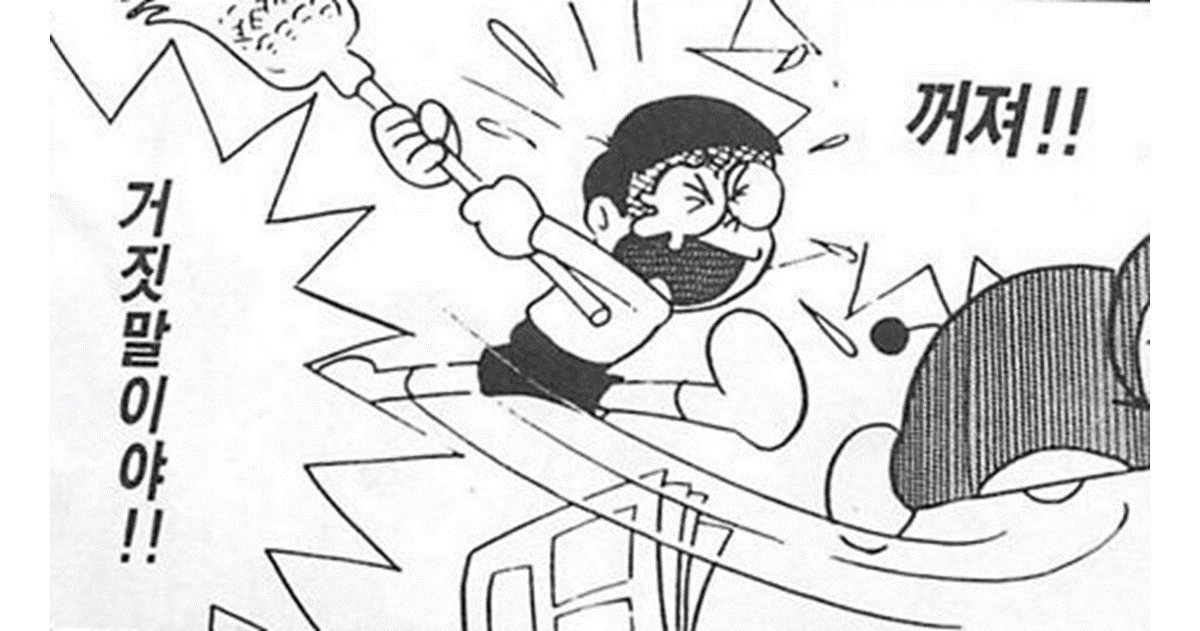윤성희의 소설집 「감기」에 수록된 단편 '이어달리기' 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 ?한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시에, 생뚱맞게도 어떤 도마가 계속 언급되는 것이다. 이 오래된 도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면서 계속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갸우뚱하던 독자들도 책을 덮으며 알게 된다.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오래된 도마라는 것을.
소설 속 도마같은 물건이 우리에게도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낸, 내 시간의 흔적들이 담긴 물건들. 나의 역사.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다. 물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난 주인들의 조각을 살펴 보았다.
'나'는 여태껏 그의 웃음을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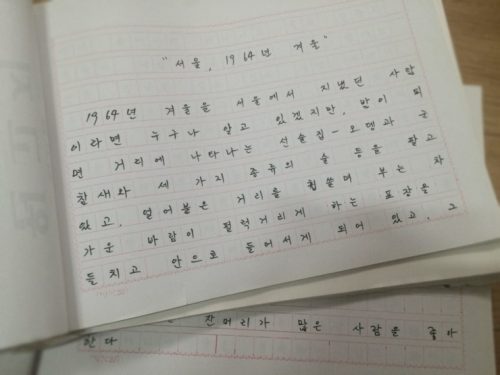
'나'는 그의 목소리를 잘 모른다.
전화할 때 빼고는 딱히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 없다. 낮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면 그래도 말도 꽤 하고, 곧잘 웃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마주할 때는 늘 지치고 우울해 보이는 걸까.
나를 싫어한다고 하기에는 그는 거의 매일 밤 나를 찾는다. 때로는 잠이 든 새벽 3시에 어두운 장롱 문을 열고 뒤적여 내 손을 잡고 끌어낸다. 내 이름은 ‘서울, 1964년 겨울’이었다가 ‘무진기행’이나 ‘환상수첩’이었다가 때로는 포르투칼 작가의 소설 제목이 되고, 어떨 때는 그가 직접 적어 내려가는 소설이 되었다가 가끔은, 그냥 백지다.
나는 그의 고등학교 기숙사 사물함에도, 군부대 관물함에도, 고향집에도, 그리고 지금 단칸의 골방에도 있다. 물건에 큰 미련 없는 그가 언제나 나를 챙겨 이동하는 것을 보면 나는 아마 그의 애인쯤 되나보다.
하나 다행인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시간, 작게는 5분에서 길 때는 동틀 녘까지 지속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생기가 돈다는 사실이다. 짐작하건대 아마 그는 낮에 웃기 위하여, 낮을 살아가기 위하여,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마주하며 슬퍼해야 하는가 보다.
/ 김다훈
'나'는 12년 묵은 반팔 티다

이마트에 있던 나'를 데려간 사람은 멍청하게 생긴 중학생이었다.
패션감각과는 꽤나 거리가 멀어 보이던 그 빡빡머리는 내가 편했는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빈번하게 날 입곤 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고등학교 야자를 째고 도망치는 저녁에, 대학에 붙어 기뻐하던 겨울에, 그리고 나한테도 좁았던 고시원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을 때까지.
군대를 다녀온 그는 내게 묻은 얼룩을 지우려 고군분투했으나 실패했고, 슬슬 목이 늘어나 구멍이 하나둘씩 증가하는 날 입고 나다니며 빈티지라 주장했다. 뭇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보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아 했다. 다시 몇 년 후, 나는 더욱 낡고, 색이 바래고, 부스러져서는 흡사 고대 그리스의 토가나 튜닉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모했다.?심미적인 기능이라거나 온도조절 따위는 개나 줘버린지 오래였다.
그렇게 길었던 열두 번의 여름을 거치며
나는 목이 어깨까지 늘어나고, 소매가 찢어지고
얼룩까지 잔뜩 묻은 티셔츠가 되었다.
그 동안
모자라 보이는 중학생이었던 그는
모자란 것이 확실한 수료생이 되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정 때문일까?
요즘 들어 그가 나를 입을 때면
이상하게 나른해서
나도 모르게 편한 것 같기도 하다.
아마, 기분 탓이겠지.
/ 조태홍
'나'는 세상을 보고 싶었다

'나'는 사당역 반디앤루니스 악세사리 판매대에 걸려있었다.
파란 문어와 하늘색 돌고래, 노란 병아리 친구들 사이에 있는 나를 누군가 집어 들었다. ?늘 빙긋 웃는 표정의 나이지만 그날은 정말로 신이나서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여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꽤나?손이 차갑던 그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었다. 나를 선물받은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때 만지작 거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냐며, 무척이나 기뻐했다.
아마 그녀는 아주 활발한 사람인 것이 분명했다. 잠시도 집에 있는 일이 잘 없었으니까. 그녀는 나를 고이 달고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녔다. 혼자서 한강을 산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왁자지껄 술을 마시기도 했다. 나는 졸려도 눈을 똑바로 뜨고, 늘 그녀의 가방에 매달려 세상을 구경하곤 했었다.
그녀는 손이 차갑던 그 사람과 자주 만났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기도 했으며, 맛있는 것과 함께 행복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등 뒤에 붙어있는지 알겠지만, 그 사람과의 전화를 끊고 그녀가 서럽게 흐느낀것도 나는 모두 다 안다. 평소에 잘 울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때는 나도 절로 슬퍼져서, 웃는 표정을 지우고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리가 낡아 내가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지고야 말았다. 이대로 멀어지나 싶었지만, 다행히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손이 차갑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들려오지 않는다. 고리가 떨어진 나는 지금, 그녀의 방 안 서랍위에 앉아 그녀를 바라본다. 조용히.
/ 도상희
'나'는 두 사람의 패딩이었다

'나'는 그의 패딩이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 겨울. 그녀는 그를 안거나 팔짱을 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느꼈다. 그녀의 가슴 언저리에서, 손목에서 나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리듬을. 두 사람은 밤에 자주 나왔다. 삼겹살을 먹으러, 치킨을 먹으러. 덕분에 나에게선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의 냄새가 났다.
다음 해 겨울,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녀는 잘 몰랐겠지만, 그는 혼자서 소나기처럼 울었다. 내 소매에 축축하게 묻은 그의 눈물들이 씁쓸했다. 그렇게 장롱 속에서 허한 몇 개월이 지나 아직 쌀쌀한 초봄, 그녀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걱정했다.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냐고, 멋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는 나를 건내주었다. 그녀도 나를 말없이 입었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리듬은 좀 달라져 있었다. 둘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쿵쿵쿵 거리던 그녀의 리듬은 점차 점점 사그러지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따뜻하게 입고 가. 그녀는 처음엔 싫다고 말하다가, 결국 알았다고 말했다. 돌아가는 길은 멀었다. 그녀는 집에 오는 길 내내 나를 꽉 안고. 한참이나 냄새를 맡았다.?
그 날 이후 그녀가 나를 입은 적은 없다. 가끔 조용히 냄새를 맡을 뿐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나를 아주 찾지 않게 되었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았다. 더 이상 그녀가 혼자 울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었지만, 내 마음은 어쩐지 복잡했다. 겨우 남아있는 그의 냄새가 스르륵 ?빠져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던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패딩, 다시 돌려주려고. 이제 없어도 괜찮을 거 같아.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깨끗하게 씻긴 뒤 상자에 고이 담겨 그에게 도착하겠지.
다시 나를 만나게 되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게서 포근한 햇빛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 모모
Twenties Timeline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누군가의 ‘죄송한 죽음’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 - 2018년 5월 28일
- [9th 모집 D-DAY] 어떤 대학생이 1년이 넘도록 트탐라를 하는 이유 - 2017년 12월 29일
- 가깝고도 낯선, 가족이라는 그 이름 - 2017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