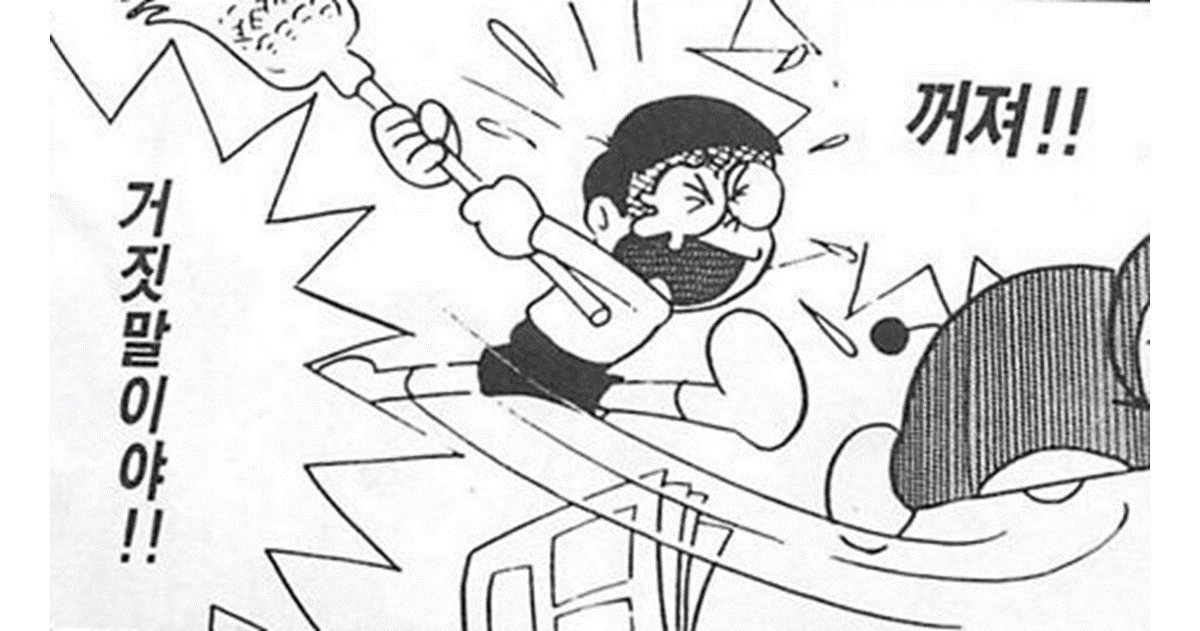수능이 1달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우리에게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옛 추억이 되어 버린 고3의 경험을 나누다가, ‘우리 모두 그 시절 자기만의 인생BGM 하나쯤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입시생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각자의 고3 시절에 힘과 즐거움이 되었던 노래들을 뮤직비디오와 함께 몇 곡 소개한다.?첨부 영상을 재생하기 전에는 딱 한 번씩만 망설여 주시길.?원치 않게 강제로 시간여행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침을 여는 노래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늘 챙겨보던 드라마를 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당시 기숙사에 살던 나는 “공블리”가 나오는 MBC<최고의 사랑>을 보기 위해 매우 부지런한 아침을 보냈었다. 새벽 다섯 시 반에 일어나 기숙사 컴퓨터실로 간다. PMP에 전날 드라마를 다운받는다. 매우 느린 기숙사 똥컴은 대략 여섯 시 반쯤 다운로드를 완료해준다. 그리고 바로 0교시에 들어간다. 정신 없이 킥킥거리고 있으니 감독 선생님이 슥 다가오신다.
“니 뭐 보노? 와 실실 웃는데?”
“인강이… 웃겨서요…”
옆에서 인강 맞다며, ‘연애 인강’이라고 놀리지만 않았어도 나의 행복한 0교시 시청 시간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열심히 딴짓하던 고3 교실의 아침 자습 풍경이 떠오른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익숙한 멜로디와, 아이유는 수능 안 쳐서 좋겠다며 함께 푸념하던 친구들의 목소리도 같이. 그래서 재수했나… 에효…
?아이유, <내 손을 잡아> / 황유라
한 여름낮의 꿈
당시 우리들 사이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습 도중에 잠이 오면 책상에 올라가서 문제를 푸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 보면 참 괴상한 문화지만. 그날도 언제나처럼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 나는 점심 이후 찾아온 식곤증을 쫓기 위해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귀에는 반복 재생을 설정해 둔 MP3 이어폰을 주섬주섬 꽂았다. 그렇게 한참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똑같이 책상 위로 올라온 애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서 문제를 풀거나,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보였다.

ⓒ 아카몬카이 일본어학교
창문으로는 뜨뜻해진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었고, 아직 에어컨을 틀지 않아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열람실을 가득 매운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숨소리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케이윌의 목소리와 함께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수험생 시절, 친구들과 한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렸던 나날들이 떠오른다. 그 여름날 치열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나른했던, 그날의 풍경이.
케이윌, <가슴이 뛴다> / 최희선
내 부숴버리고 싶은 욕망
고3의 어느 아무것도 아닌 날 중 하나, 나는 유독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끙끙대며 붙잡고 있었다. 장시간의 사투로 머리 속엔 안개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나는 이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친구의 MP3를 가져왔다. 이놈은 참 이상한 노래를 많이 듣는단 말이야. 기분 전환이나 해야지. 그러나 무심코 누른 노래는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붜드카! 쿠오오쾅콰쾅 붜드카!!! 유 삘 리얼리 스트롱거!!!
이 새낀 대체 뭘 쳐 듣는 거지?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메탈’이란 말인가…? 헌데 충격에 빠진 내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뱃속이 시원한 기분이랄까, 귀는 좀 아프지만서도 새로운 힘이 채워지는 듯했다.?세상을 원망하던 나는 타올라 재가 되고, 다시 태어난 내가 끙끙대며 붙잡고 있던 수리 문제집을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문제를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교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험 생활이 끝난 뒤 한동안 이런 노래들을 잊고 지냈는데, 아마 그때의 사방이 꽉 막힌 그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 자소서로 가득한 나의 밤은 다시 한번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은 욕망에 휩싸인다.
KORPIKLAANI, <VODKA> / 허자인
군중 속에서 홀로
수학을 가장 못했다. 수학적 재능이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흥미가 전혀 없는 편이었다. 친구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사탕을 먹는데 누가 몇 번 이겨 사탕을 몇 개 먹는지의 경우의 수를 도대체 왜 따져야 하는 건지. 나라면 그냥 안 먹고 말겠다. 도통 정이 붙지 않는 수학 때문에 하루 동안의 쉬는시간을 모두 수학문제 풀이에 끌어 써야 했다. 시끄럽게 놀라고 주는 쉬는시간인 만큼, 내 주변 교실 곳곳에서는 축구와 야구경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학교대사전
덕분에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는 외국 노래만 주구장창 흘러 나왔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가사가 나오면 노래마저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특히 제이슨 므라즈 노래를 많이 들었다. 잠을 쫓아주는 경쾌한 리듬이 문제풀이에 딱 좋았다. 하지만?밝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혼자 조용히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I'm Yours. 나는 네 것이라는 달콤한 가사는 아이러니하게 아직도 그 때의 혼자였던 기분을 내게 불러온다.
Jason Mraz, <I'm Yours> / 김다훈
긴 어둠의 끝에
열 시 반, 피곤함에 늘어지는 다리에 힘을 주며 숨어들듯 독서실로 향한다. 가장 구석진 자리의 커튼을 열고 무거운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으면 나만의 작은 자유가 시작된다. 낮 동안 주구장창 인강만 돌려보던 PMP에 서둘러 이어폰을 꽂고, 목록의 맨 끝에서 영화 하나를 찾아 재생한다. 락밴드 ‘메이트’의 이야기를 담은<PLAY>. 이미 몇 번이고 돌려본 영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느 때보다 동그랗게 눈이 떠졌다. 좋아하는 장면은 한 번씩 더 돌려보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다.?수능특강을 한 장이라도 더 봐야 할 시간에 영화를 보다니. 양심은 조금 찔리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

ⓒ 영화 ‘플레이’ 포스터
주인공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빛을 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도 조금만 지나면 그들만큼 행복한 표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공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저 거친 세상들 속에 맞선 작은 꿈을 보아요. 언젠가 펼쳐질 그대의 날들이 환히 빛날 수 있게” 소리 높여 불렀던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쏟아지는 할 것들에 벅차고 고달팠지만, 앞으로의 날들에는 꿈과 희망 가득했던, 조금은 짠한 시절의 내 모습이.
메이트, <이제 다시> / 문여름
Twenties Timeline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누군가의 ‘죄송한 죽음’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 - 2018년 5월 28일
- [9th 모집 D-DAY] 어떤 대학생이 1년이 넘도록 트탐라를 하는 이유 - 2017년 12월 29일
- 가깝고도 낯선, 가족이라는 그 이름 - 2017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