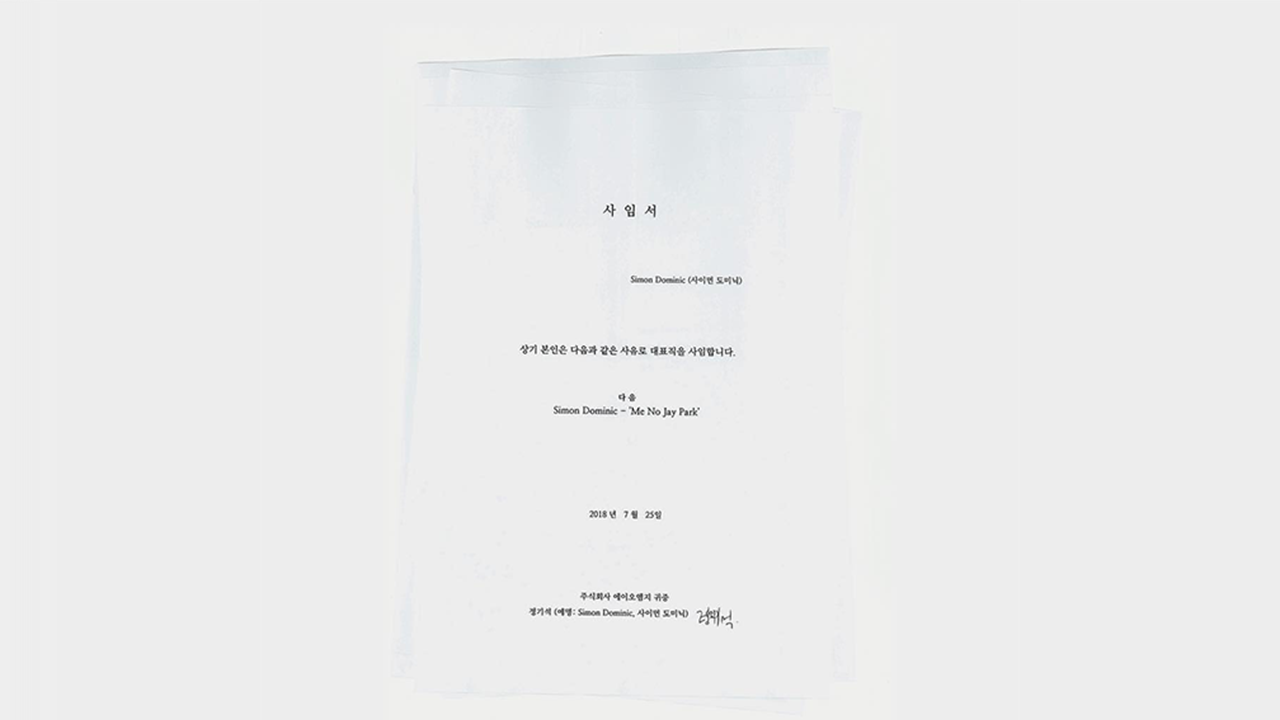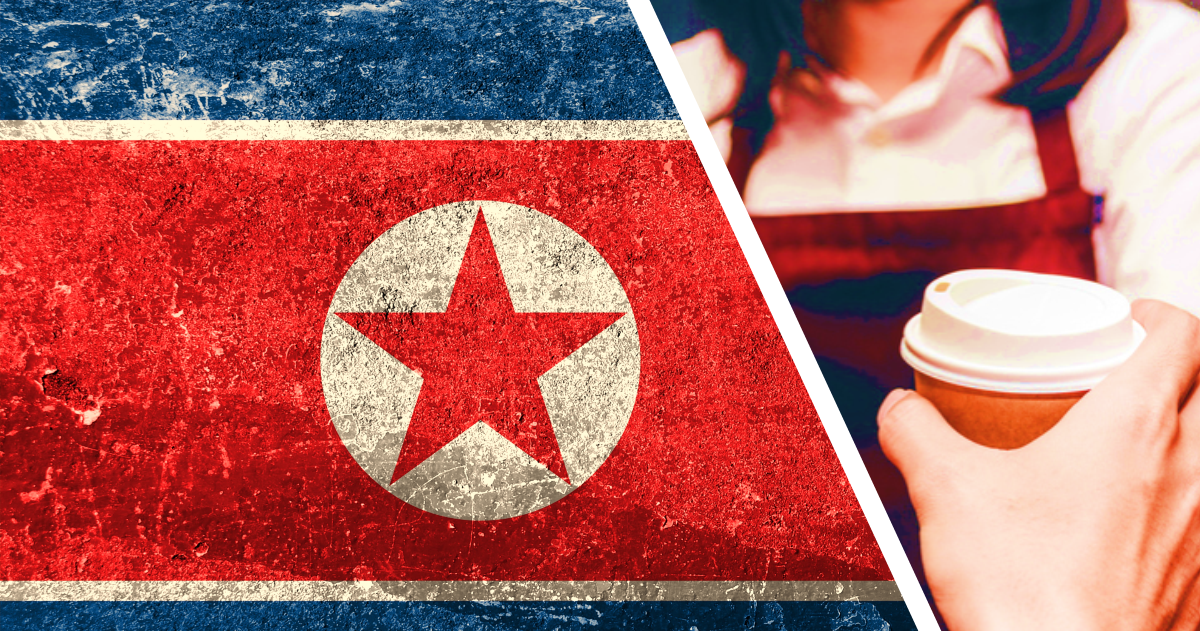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휴학하면 뭐 할 거야?”
나의 결심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백이면 백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그때마다 확신에 찬 답변을 하지 못했다. 휴학에 흔히 따라오는 구체적이고 거창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게. 나는 무엇을 하려고?
“그냥, 공부 하고, 조금 쉬고, 내 색깔을 찾고 싶어서…?"
겨우 희뿌연 대답을 ?죄인처럼 내뱉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휴학을 하면 무엇을 하는걸까? 어떤 이는 절친과 유럽으로 떠난다고 하더라.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그 머나먼 길을 헤쳐나갈 친구도 없다. 다른 이는 휴학 생활 동안 커다란 기업의 인턴을 한다고 하더라. 나는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어떤 회사에 가야 할지도 몰랐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없었으니까 뽑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 누구는 1년 동안 미친 듯이 놀겠다고 말한다. 와. 멋있고 경이롭다.
하지만 내게 그럴 만한 배짱은 없었다.

나만 계획 없어… 다들 계획 있는데 나만 없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휴학을 저지른 스물두 살의 학생이, 아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잉여’가 되었다. 근본 없는 휴학의 시작은 역시나 괜찮지 않았다. 남들이 학생 식당에 들어갈 시간에 눈을 뜰 때마다 불안감이 가득 몰려왔다. 나 뭐하고 살지.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뭐 먹고살래. 나 잘하는 게 뭐냐. 남들보다 나는 덜떨어져- 가만히 누워 스스로를 날카롭게 찌르는 목소리를 듣는 날들이 많아졌다.
어떤 날은 엉엉 울고 창문을 열어 보니 해가 떨어져 있었고,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일부러 거울 앞에서 밥을 먹었다. 밥이 원래 짠지 내 눈물이 짠지 반찬이 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하루는 누군가를 만나야 겠다고 생각했다. 카톡 목록을 뒤적뒤적 찾아본다. 스크롤을 올리던 손가락이 잠시 멈춘다. 그리고 고민. 얘한테 연락하면 놀고 먹는 휴학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냐 아냐. 그럴 친구는 아니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건다.
“미안 나 내일 중요한 시험이라서. 20점짜리야…”
그렇게나 싫던 중간고사마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만 일정 없어… 다들 일정 있는데 나만 없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독서실과 헬스를 등록했다.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가는 주 5일 알바를 시작했다. 외주 작업도 가득 구했다. 덕분에 꼭두새벽에 일어나 헬스로 시작해 독서실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외주 작업이 깜깜한 새벽 작업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계획대로 하루를 마치는 날도 있었지만, 불안함에 가득 잡아 놓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날도 많았다. 그럴 때면 가슴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지켜보던 친한 언니가 말했다.
“아연이는 내가 본 휴학생 중에서 가장 알차게 살고 있는 거 같아.”
그야말로, 내가 원하던 휴학의 모습이었다. 그 소릴 듣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며 일과에 매달렸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나라는 통에 담았던 것들이 떨어질 만큼 쌓이고 쌓였는데도, 손으로 그 통을 두드려보면 텅 빈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다.

그랬다. 휴학 첫 날과 마찬가지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단단하게 묶어두기만 했던 것이었다.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남은 헬스와 독서실에 남은 짐을 집으로 들고 왔다. 딱 삼 개월만, 불안에 떨지 말고, 그냥 쉬어보자고 나를 다독거렸다.
그렇게 나는 다시 잉여가 되었다.
계획 없는 잉여 생활이 시작되다
지도를 펼쳐 내가 가 본 곳을 세어 보았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래서, 가 보기로 했다.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그게 다였다. 물론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버스를 놓치고 표를 잘못 끊고 걸핏하면 밥을 굶고 넘어지고 돈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행지에서는 10년 뒤 내 진로보다 어둑어둑해지는 골목 사이에서 내가 당장 몸 뉠 숙소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던가.
계획 없는 여행이 어쩌다 보니 끝이 났다. 이전의 불안감이 다시 나를 덮치는 것은 싫었다. 사소하지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씻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그러고는, 매일매일 다른 색깔로 나의 하루를 채우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천장만 바라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쳇 파커의 와인 같은 음성에 취했다. 신나고 싶을 땐 The 1975의 기타 소리에 맞춰 춤도 춰 봤다. 또 다른 하루는 같은 책을 연속으로 세 번 읽으며 놓쳤던 부분을 찾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다. 영화 수십 편을 몰아보기도 했다.
하루는 천장만 바라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쳇 파커의 와인 같은 음성에 취했다. 신나고 싶을 땐 The 1975의 기타 소리에 맞춰 춤도 춰 봤다. 또 다른 하루는 같은 책을 연속으로 세 번 읽으며 놓쳤던 부분을 찾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다. 영화 수십 편을 몰아보기도 했다.
돈이 없으면 단기 알바를 뛰었다. 그렇게 번 돈을 무작정 탕진해 보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트 가득 빼곡히 단어를 채우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다 아끼던 만년필이 다 닳아 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매일 다른 하루를 보냈다. 잔잔한 바다처럼 조용한 시간이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3개월이 지난 후
얻은 것은 사소했다. 노래 가사를 징그럽게도 못 외우던 나도 10번 반복해서 들으면 외울 수 있다는 사실. 영화 ‘레옹’에서 마틸다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 횟수. 하늘이 칙칙해도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얻었다.

자신감이 +100 상승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철없고 못난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맞다. 벌어야 하만 하는 월세와 나를 앞서가는 경쟁 상대를 생각하면 여전히 끊임없이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이다. 혼자만을 위한 이만큼의 시간조차 없이 남은 생을 버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롭고 고단한 일이 아닐까.
누군가 다시 휴학하면 무얼 할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양하고 경험하며 찾아가면서, 소소한 것에 기뻐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벌써부터 재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 시간 끝에서 발견한 진짜 ‘내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를 알 수 있었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