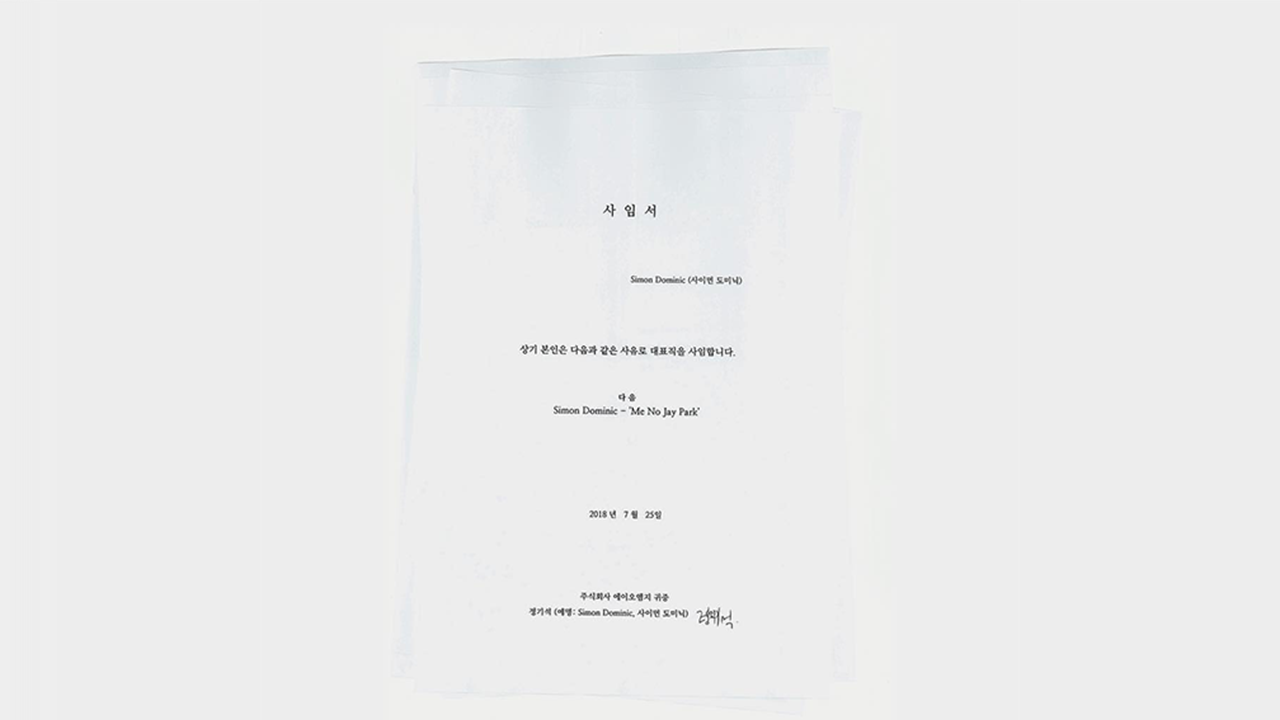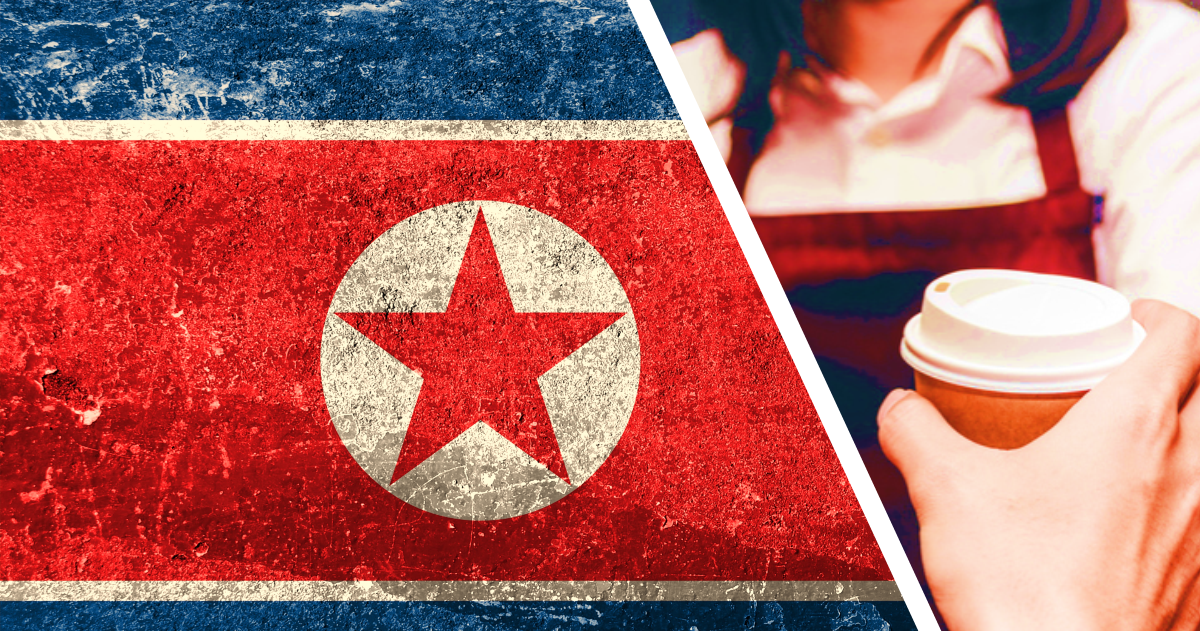내가 만든 인물들이 당신을 대신해 앓았으면 좋겠다.
국문과 학부생 시절, 과제를 위해 김이설의 소설 <나쁜 피>를 읽었다. 너무 우울한 소설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을 느끼면서 책을 덮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읽고 나니 감기를 앓다 나은 것 같은 개운함이 느껴졌다. 이 우울한 소설을 읽고 나는 왜 개운했을까.
등장인물의 가난과 모녀 갈등에 시나브로 감정 이입을 한 것일까. 주인공과 모양이야 다르지만 나도 가난에 시달렸고 엄마와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괜히 내 삶이 이해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작가의 말’을 보니 “내가 만든 인물들이 당신을 대신해 앓았으면 좋겠다”는 문장이 놓여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세상에 왜 ‘우울한 예술’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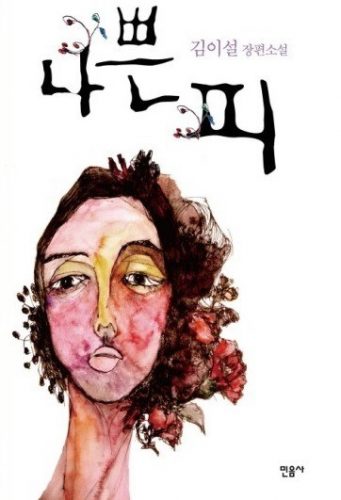
굉장히 우울한 소설. 기분 좋은 날엔 읽지 마시길.
‘작품이 내 대신 앓는다’라고 얘기하면, 작품에겐 미안한 말일지 모른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상처를 품고 있는 작품 덕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세상의 모든 우울한 예술, 그러니까 소설과 음악과 영화와 시와 그림 등은 다 이런 이유로 존재한다.
물론 모든 작가의 마음이 다 김이설 작가와 같을 순 없다. 누군가는 남의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위로로 작품을 만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든 우울한 예술은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 누구나 크고 작게 비슷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도전, 의지, 열정” 등의 단어로 청년에게 강요돼 왔던 ‘긍정의 힘’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돼 주지 못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너 여기서 뭐해? 너 아프구나. 청춘 때는 원래 그래. 그렇지만 빨리 나가야지” 하며 앉아 있는 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 버리는 것이다. 여기엔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다.
행여나 그늘을 나가는 행동이 굼뜨면 “정신이 나약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우울증 걸리는 거야” 라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것이 내가 경험했고, 사회가 허락한 긍정이었다. 그러나 우울한 예술은 그늘 밑 사람의 옆에 와 같이 앉는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세상 정말 좆같지 않냐고. 우리는 어쩌면, 시덥잖은 말 몇 마디보다 그늘 밑에 같이 앉아 주는, 내 마음을 알 것 같은 이가 있어주길 원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 국어교과서에서조차 슬픔을 참으면 ‘절제미’라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술가가 있다. 그것도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 ‘사탄’이라 불렀다
20대 초반의 홍대 대학생.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부분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연애도 하고, 방학이면 엠티도 가고, 인스타그램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만 올라와 있을 것 같은 이미지는 이 사회가 합의한 청년의 이미지다.
우원재는 그런 이미지와 정반대에 있다. 한여름에 털비니를 눈 바로 위까지 뒤집어 쓴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카메라와 관객을 노려 보며 랩을 한다.

쇼미더머니6 우원재 1차 예선.
이토록 솔직한 가사가 있을까. ‘죽고 싶다, 나 약 먹는다, 이게 내 삶을 설명한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말했다. ‘어둡다, 다크하다, 악마고 사탄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다. 약까지 먹진 않더라도 저마다 우울한 적 있으면서, 왜 우울한 음악을 하면 악마나 사탄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일까.
사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예술이 아니라 그냥 ‘앓는 소리’로 하면 들려오는 소리는 으레 이렇다. “너 큰일 날 소리 한다. 널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잖아. 죽을 용기로 살아.”
20대 중반 때, 우울함을 견디다 방문한 병원의 의사도 그랬다. “민지 씨 나이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민지 씨 나이 때는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치맥 몇 번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의사는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돌려 하고 있었다.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 세상은 온통 이분법이다. 긍정적인 젊은 청년과 부정적인 우울함의 악마, 혹은 사탄. 후자에 기울어져 있는 청년에겐 마치 그가 젊음의 직무를 유기라도 하는 양 “젊은 애가 왜 그러고 있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행복해 져야지”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 그런 이들에게 우원재는 이야기한다.

유행어가 된 우원재의 가사.
나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 수록 내 인생을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버거울 때가 많았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체적인 삶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늘 시키는대로만 했는데 스무 살이 넘고 나니 내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게 힘들었다. 우원재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공인 내 삶이 비극인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행복 별 거아냐” 라고 쉽게 말했지만 그 ‘별 것 아닌 행복’조차 누리기 어려운 나에게 세상은 지옥이었다. 이런 고민을 20대 내내 했다. 그리고 많은 20대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한 번은 페이스북에 비 오고 어두운 날이 좋다고 쓰니 교수님이 댓글을 달았다. “민지는 뛰어다니기 좋은 봄날씨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라고 말이다. 어른들이 원하고 바라는 젊은이의 모습은 대체로 이럴 것이다. 그러나 우원재는, 나는, 많은 20대는 그렇지 않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젊은이의 모습과 다른 사람 중 한 명인 우원재는 많은 20대가 지나가고 앉아 있는 그늘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중이다. 그의 예술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돼 줬는데, 이만하면 악마가 아니라 천사 아닐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어른들에 비하면 말이다.
그의 우울한 가사들은 유행어가 됐다
‘유행어 : 비교적 짧은 시기에 사람들에 의해 널리 쓰이는 말.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
그렇다. 우원재의 가사들은 유행어가 됐다. 그를 패러디한 광고와 스탠딩 코미디쇼 캐릭터도 등장했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 털비니를 사고, 그의 가사를 따라 부른다. 부정적인 것들은 대체로 외면하는 사회에서, 우울한 가사가 유행어가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행이 된 우원재의 가사에 어떤 사회상이 반영돼 있을까. 청년 실업? 청년 우울증? 이렇게 해석하면 좀 유치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 게 한두 해도 아닌데 뭐가 바뀐 적이나 있었나.

우원재는 자신이 하고 싶음 음악에 랩이 제일 최적화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은 다들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 우울해, 세상은 별로야”라고. 그래서 우원재의 등장이 반갑다. 젊은이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게 미덕이 아닌 사회에서 우울함을 이야기하는 젊은 예술가는 음악은 소중하다. 긍정을 강요하는 기성세대를 향한 작은 저항이랄까. 일관되게 염세적인 내용의 그의 가사가 유행어가 된 것 자체가 기쁘다.
우울한 예술은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 그 예술들은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 ‘나’를 견뎌낸다. 그 예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나’의 초상들은 내 친구와 자매, 형제가 된다. 그 예술들은 우울함을 벗어나자고 굳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나’의 존재를 긍정한다. 우원재의 음악이 그렇다.
하민지
하민지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화제의 프로 ‘영수증’이 내게 남긴 것 - 2017년 10월 25일
- 지금 우리에게 우원재의 우울함이 필요한 이유 - 2017년 9월 14일
- 지난 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 2017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