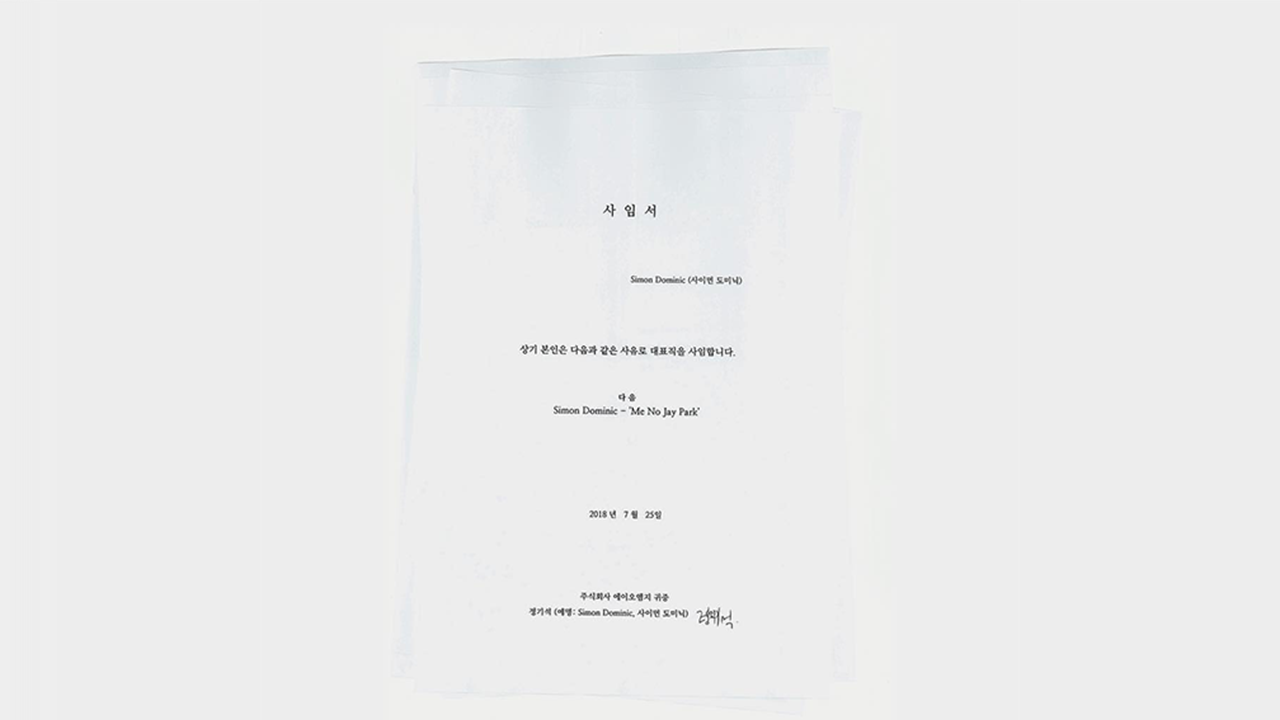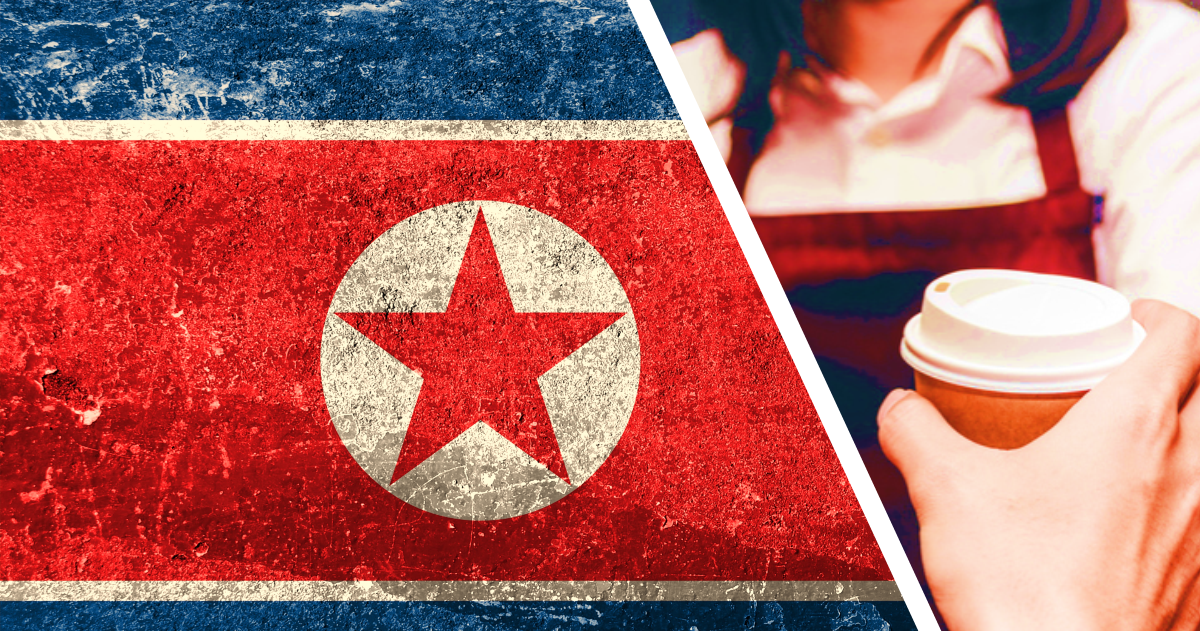얼마 전 핸드폰 케이스를 하나 샀다
그리 유별난 녀석은 아니다. 매끈한 몸체에 플랫한 재질의 평범한 녀석인데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케이스 뒤편이 물감으로 범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보고 좋고 싫음을 떠올리기 전에, 이 케이스를 사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유는 좀 심심할지 모른다. 그냥, 내 전공인 '미대'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좋아하는 한국영화가 뭐냐고 물으면 내용도 가물가물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습관처럼 말한다. 러닝타임이 2시간도 안 되는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를 다 보는 데 6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더 비밀인 것은 줄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우 다 보고서 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영화의 미장센을 칭찬했다. 왜냐면, 그게 더 아름다운 취향인 것 같으니까.

사실, 보다가 몇 번씩 졸았다.
습관적 댓글 확인 증후군
한 가지 못 된 습관이 생겼다. 어떤 콘텐츠를 하나 감상할 때 꼭 댓글도 함께 보는 습관이다. 왓챠 플레이로 영화를 한 편 보고서도 꼭 댓글을 확인한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좋은 영화였다고 중얼거리면서도 그다음엔 꼭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한다. 댓글이 모두 칭찬 일색이면 왠지 모르게 안도하게 된다. 다행이다. 내 취향이 아직 틀린 게 아니구나.
타인과 달라지려고 여기저기 물감을 바르는 와중에도 남들과 같음에 나는 안도하고 있다.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애초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서 시작한 일이지 않던가.? 내가 억지로 구해 바른 색이 아름답다고 말해줄 누군가들이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들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칭송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그렇게 내 취향을 남과 상의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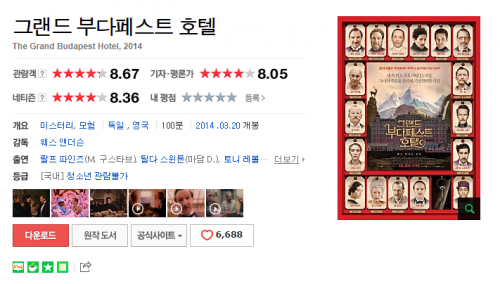
나는 오늘도 평점을 보고, 남들의 생각을 섭취한다.
이렇게 나는 요즘 취향을 성형하는 중이다. 취향을 성형한다는 것은 마치 컬러링을 아름답게 설정해놓는 것과 비슷하다. 컬러링은 사실 내가 듣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이 나에게 이런 인상을 받았으면 좋기에 걸어두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내 번호를 누르며 듣게 될 음악의 이미지가 ‘나’의 모습으로 이해되길 바라듯, 아름답게 성형한 내 취향으로 사람들이 나를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덕분에 나는 이제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며 울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미술관보다 집에서 유튜브나 보는 게 즐겁다고? 밝힐 수 없다.? 굳이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서로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서로가 더 옳다고 믿고 있는 적당한 편견이 있는 편이 보기에 좋고, 남들도 편안할 것을 알고 있다.

나만 여기서 펑펑 울었던 거 아니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엄밀히 말하면, 우린 다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형형색색의 색깔로 각자 고유하게 빛난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자기소개서는 남들과 다른 점을 말하라고 하고 더욱 특별한 점을 어필히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과장된 언어로 스스로를 채색해야 한다. 다분히 경쟁적이며 생존적인 문제이다.
덕분에 별거 아닌 취미는 쓸모가 없다. 남들보다 더 개성 있어 보이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취미가 독서나 영화감상이어도, 그래선 안 된다. 자기소개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 살아남는 일에 비하면 취향을 성형하는 일은 너무 우스울정도로 쉬운 일이다. 그 와중에 영화 <아이언맨3>를 정말 좋아하던 나의 마음은 조금씩 탈곡되어 벗겨져 나간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보다 날이 선 취미를 찾아 단어를 갈아 끼워야 한다. 특별해야 하고 캐릭터가 있어야 하며, 그런 곳에서 오는 매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취업이 되고 그래야 입체적인 인재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덧칠한 색들이 범벅된 지금의 내가 있다.
여전히 나는 아이언맨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취향을 뜯어고치고 있는 만큼, 원래의 내 취향이 무엇이었는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성형을 많이 하면 원래 얼굴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하던데, 감정과 취향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내가 원래 무엇을 좋아했는지 발음해본 적이 너무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취향을 성형하는 것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내게 인생 영화를 묻는다면 머리로 잠시 고민을 하다가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를 꺼낼 것이다. 그게 행여 머리에서 나온 답임을 알더라도 가슴에서 나왔다고 믿으며 말이다. 물론, 집 노트북에 〈아이언맨〉 시리즈 전편이 다운 받아져 있으며, 그것이 내 컴퓨터에 소장 중인 유일한 영화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 '캠벨 수프 캔', (1962)
유현준
유현준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이 시대의 수많은 ‘사이먼 D’에게 - 2018년 9월 16일
- 취향을 성형하는 중입니다 - 2018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