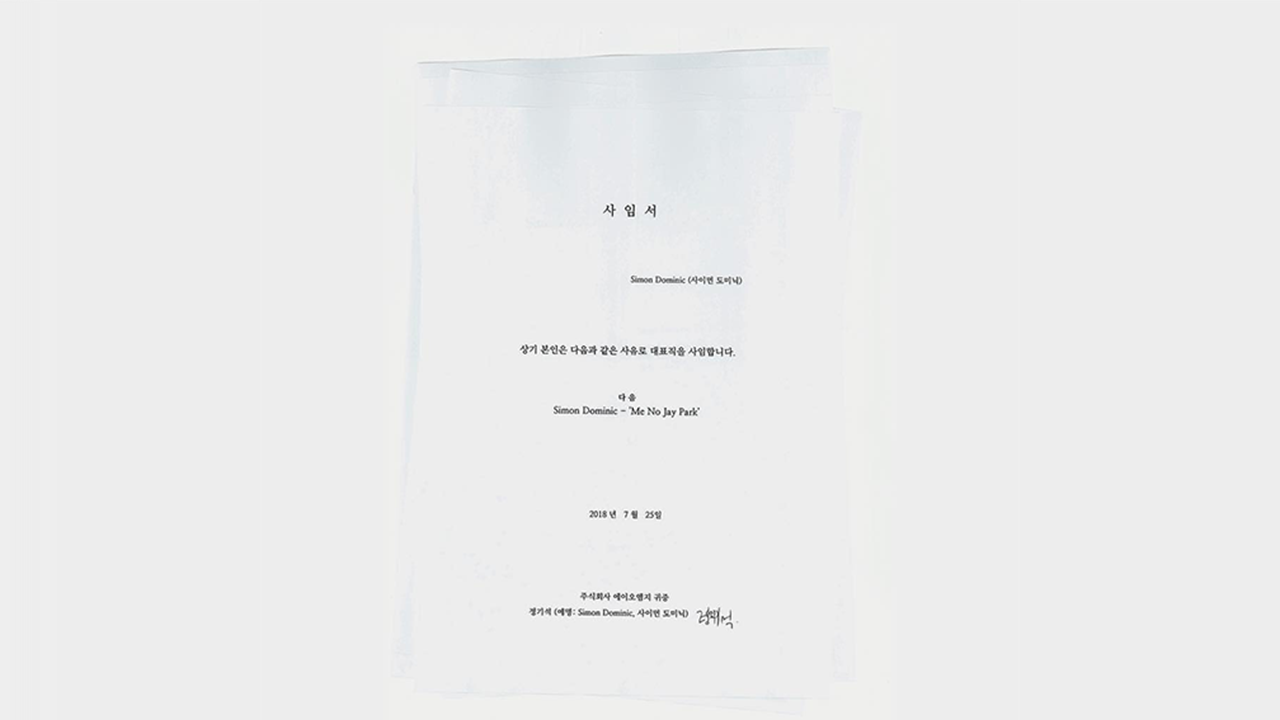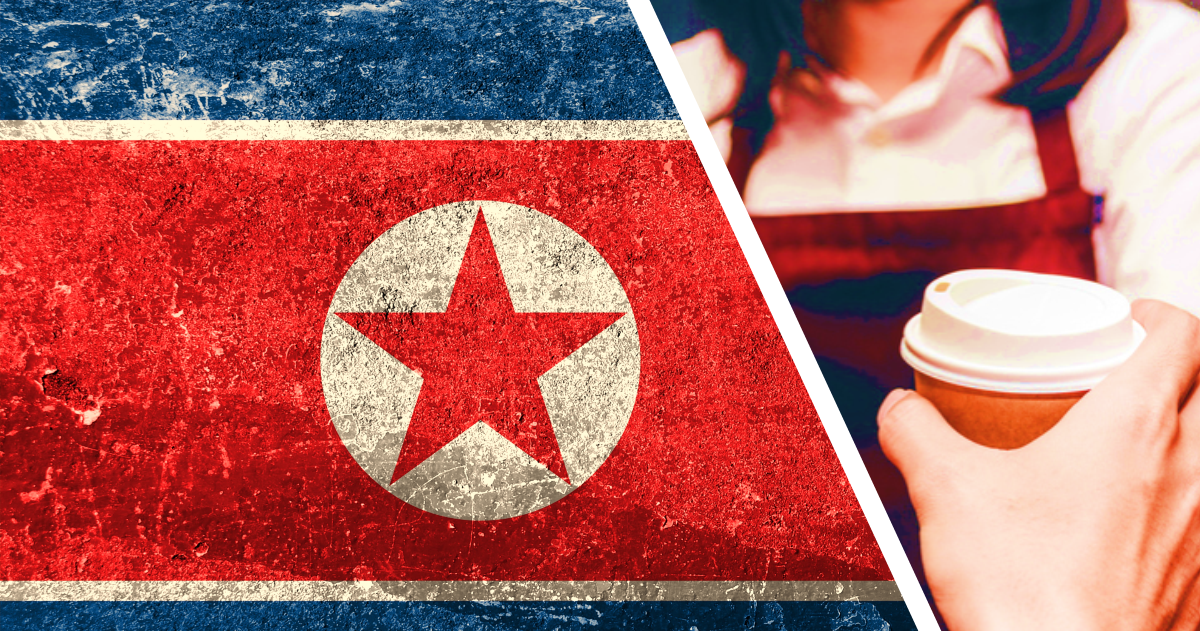스무살, 첫 장학생 면접을 보았다.
두근거림과 흥분을 겨우 감추고 면접장에 들어선 나는 꿈과 포부를 묻는 질문들에 밤새 연습한대로 막힘 없이 답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 이대로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중 한 가지 질문을 또 받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일 비참했던 순간이 언제에요?
"나는 돈 벌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은연중에 흥미로워하는 눈빛이 덤덤한표정 속에서 읽혔다. 자, 어디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꺼내봐. 덩그러니 남겨진 내게 쏠린 모든 시선이 살갗에 닿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속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나에게는 이 무대가 너무나 버거웠다.
잠깐의 침묵 끝에 가장자리에서 겉돌던 이야기 하나를 살며시 내밀었다.
“생각보다 힘든 걸 잘 모르면서 살아온 친구였네”
하며 사람 좋게 웃는 그들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나왔다. 무엇인지 모를 이 허무함을 토해내고 싶을 때쯤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근황을 묻는 말에 곧이어 장학금 면접은 어땠어? 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애석하게도 일주일 뒤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등록금 납부일은 당장 한 달 뒤로 다가왔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금의 나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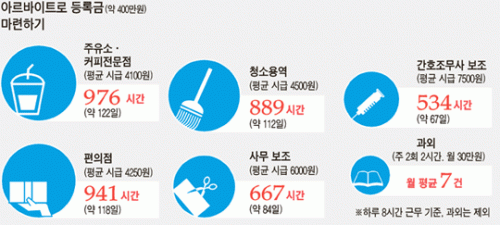
나는 스스로 증명해내야 했다.
몇 차례의 면접이 이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자연스레 한 층 깊은 곳을 파보려는 질문들이 날아왔다. 이를테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에둘러 말할 때면 기어코 끄집어내어 파고들려는 질문들에 나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덧 처음 보는 낯선 이들 앞에 서서 가장 깊숙한 것들을 도려내어 꺼내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될 때면, 속으로 나를 가까이서 들여다본 누군가가 되어 내 삶을 증언하는 중이라 되뇌었다. 겨우 덮어두었던 지독한 기억들을 스스로 다시 꺼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성실히 증명해내는 나에게 면접관들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눈빛을 가져보려 애쓰고 있었다. 훌륭하게 잘 컸다는 칭찬과 흡족한 표정으로 면접을 마친 이들을 등지고 더욱 크게 찾아온 공허함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가는 버스에 한참을 기댔다.
이렇게 빚어낸 나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드디어 닿은 것일까, 나는 세 차례의 최종 면접에 모두 합격했다. 그간의 허무함이 우습게도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이번엔 잘 팔려서 다행이었다.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술기운을 빌려 면접에서 생긴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야, 나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었다. 다 뒤집어 엎었지.”
친구들은 발끈하며 나보다 더 화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화를 낼 수 없었다. 밝은 성격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반증하고자 나의 어려움을 여실히 증명하는 서류들을 열심히 모아 제출하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들 앞에서 이 정도면 될까, 아님 조금 더 아픈 것이 좋을까, 하며 이것저것 꺼내 보이기 바빴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꺾일 줄 몰랐던 당당한 성격과 낙천적인 사고 방식은 나의 자부심 중 하나였는데 유독 면접에서만큼은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견뎌냈는지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꺾일 줄 몰랐던 당당한 성격과 낙천적인 사고 방식은 나의 자부심 중 하나였는데 유독 면접에서만큼은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견뎌냈는지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의 눈 앞에 앉은 여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의 이미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진실됨을 어필하라기에 그대로 보여주었는데도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온전한 나의 일부는 쉽사리 부정당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인재상이 되지는 않을거다.
완벽한 답안지가 되기 위해 겨우 깎아보고 조립해나간 덕분인지 이제 겉으로는 완벽히 적합한 지원자의 모습을 갖추어간다. 한 때는 몇 일이고 나를 부수었던 시선과 말투가 이따금씩 섞여 날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칠 때면, 익숙해짐이란 실로 얼마나 서글픈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나답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진 모습이 어필한 진실됨이 통할 때면 이게 정말 나여야만 살아낼 수 있는걸까 싶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정말로 닮고 싶지 않은 어떤 어른이 면접을 마친 뒤 날 더러 "학생 참 마음에 든다"고 할 때 여전히 꽤나 끔찍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수고했다는 말에 '네 감사합니다-'라는 뻥을 치고 나와 생각한다. 사실 난 그런 인재상이 되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그래도 이따금씩, 누군가의 상처에 대한 무감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실감하게 해줘서, 약간은 고맙다고.
양소희
양소희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북에서 교사였던 그녀는 여기서 카페 알바를 한다 - 2018년 9월 7일
- 그들은 나의 고통을 증명하기를 바랬다 - 2018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