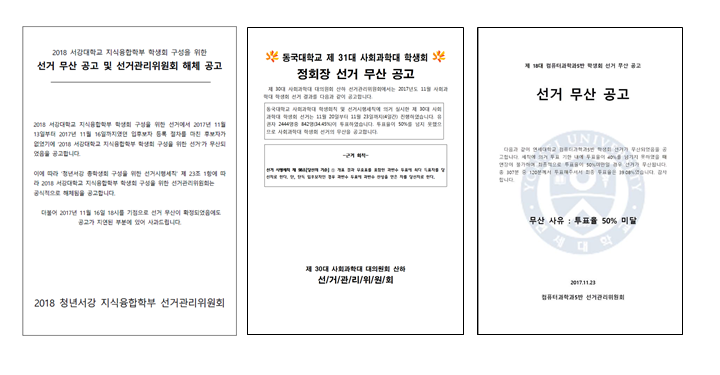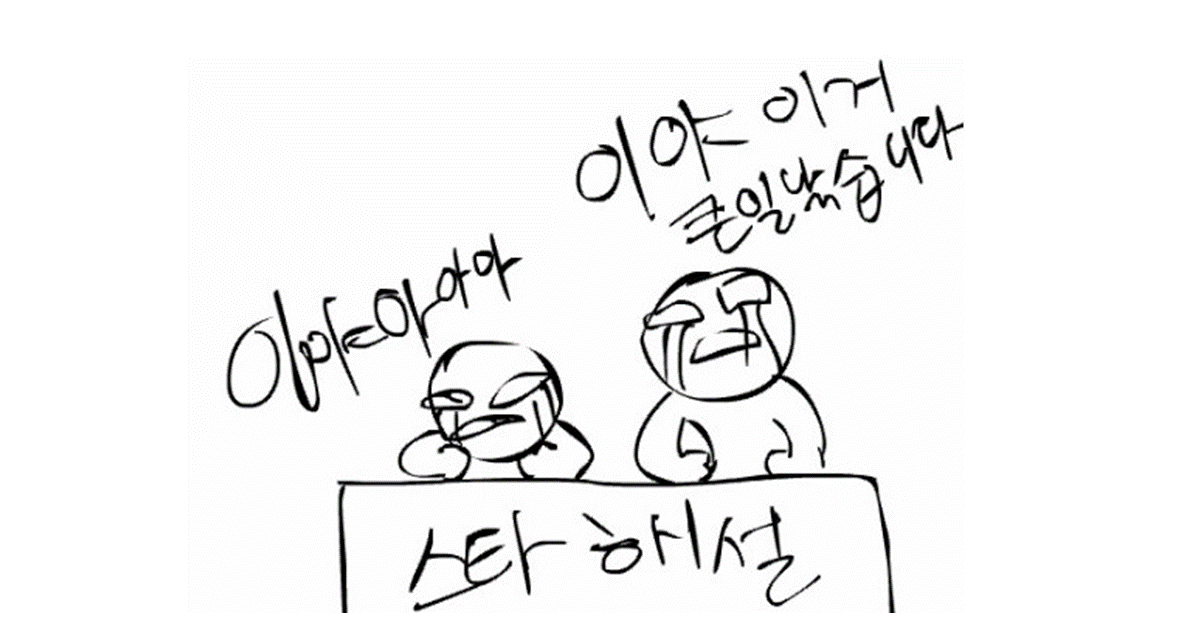“왕위에 올라선 다음 귀가 갑자기 커져 당나귀 귀 같았다.
왕후와 궁인들 아무도 몰랐으나, 오직 복두(?頭)장이 한 사람만이 알았다.
그러나 평생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죽을 무렵, 도림사(道林寺)의 대나무 숲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네.’
그 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이 이를 싫어하여 곧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다만,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네’라고 들렸다.”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 어서 말해봐.
언젠가부터 이 도림사의 대나무 숲은 우리 옆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 옆 대나무숲’이라는 이름으로 SNS 상에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은 평소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익명으로 맘껏 외쳤다. 그렇게 신라 어느 복두장이의 대나무 숲은 우후죽순처럼 퍼져,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꽤나 익숙한 것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대나무숲 죽돌이’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실, 나 또한 그 ‘대나무숲 죽돌이’ 중 한 명이었다. 다른 말로 소위 ‘네임드’였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나는 언제나 대나무 숲 속에 있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찾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읽고 진심으로 고민하며 상처입은 누군가의 말들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다. 내 댓글에 ‘좋아요’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이 곳에서 필요로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아휴 그러셨구나. 네 다음 제보요. ⓒ부르스올마이티
물론 나는 진지했다. 도움이 되고 싶었다. 결코 누군가의 고민에 가볍게 말을 내뱉지 않으려 했다. 내 지난 날의 후회와 안타까운 삶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댓글을 작성했다. 짝사랑에 고민하는 A에겐 전하지 못해 아팠던 나날들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B에겐 하지 못한 일들에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을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이 내 댓글에 공감하는 듯했다. 댓글엔 어김없이 ‘좋아요’가 달렸다. 그렇게 어느 댓글이 좋아요 100개를 넘어가던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달던 댓글들은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이런 고민도 순간이었다. 제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제보자 : 저기요..제 사연은요?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새벽 잠 안 오는 밤이었다.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너무 힘들고 보고 싶어 괴롭다는 실연의 사연이 대나무 숲에 올라왔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힘내라는 말로 시작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둥, 정 힘들면 다시 연락해보라는 둥 사실은 무슨 위로가 될까 싶은 뻔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천천히 댓글을 읽는 와중에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어투를 사용하며 나와는 너무나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게 종종 거슬렸던, 또 다른 어느 ‘죽돌이’였다. 가만 둘 수 없었다. 즉시 댓글을 달았다. 남의 실연이 웃음거리냐며, 제보자가 마음 아파하는 건 안중에도 없냐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아 좀 말이 심하시네요 ㅡㅡ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도 몇 번의 댓글이 오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글에 ‘좋아요’가 바로 여럿 달리기 시작했다. 점점 분위기는 내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댓글을 쓴 사람은 본인의 댓글을 삭제했다. 이제까지 벼르고 있었단 감정을 모두 쏟아버릴 수 있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내 댓글의 ‘좋아요’를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순하게 ‘이겼다’고만 생각했다. 어느새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픔과 고민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와중에 이별에 슬퍼하는 그 사람은 사라졌고, 맥락은 잊혀졌고, 남은 것은 모니터 앞의 젠체하는 내 모습뿐이었다.
대나무 숲을 떠나보내며
그깟 엄지손가락 몇십 개 받았다고 해서 내 댓글이 아픈 실연을 겪은 제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 익명의 제보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은 잊혀졌고, 많은 사람들은 달려들어 자신의 맥락 속에서 나름의 ‘조언’을 했고, 때로는 무섭게 난도질하기도 했다.

저기 저 사연쓴 사람인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한 가운데 ‘나’가 있었다. 후회보다는 무서웠다. 나는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타인의 아픔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길 바랐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민 속에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결국 난 ‘대나무숲’의 받아보기를 조용히 취소했고, 이젠 그곳에 댓글을 달지 않는다. 아마 책임지기 싫은 탓이다. 가볍거나 혹은 무겁거나, 어떤 형태로든 던져진 말은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내 말에 어떠한 책임도 다할 수가 없었고, 더해서 나는 당장 내 앞길을 책임지기도 바쁜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 공간에서 사실 중요한 건 말하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2천 년 전 신라의 복두장이도, 대답이 듣고 싶어서 도림사 옆 대나무 숲을 찾았겠는가. 내 댓글 또한 사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싫었다.
개강이 왔다. 여전히 나는 대나무숲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윤형기
윤형기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썸을 판단하는 나만의 근거 - 2017년 4월 18일
- “게임이 망할 것 같으니, 순순히 협조하세요.” - 2017년 1월 23일
- 최악의 헬을 가린다! 헬뭇잎마을 VS 헬조선 - 2016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