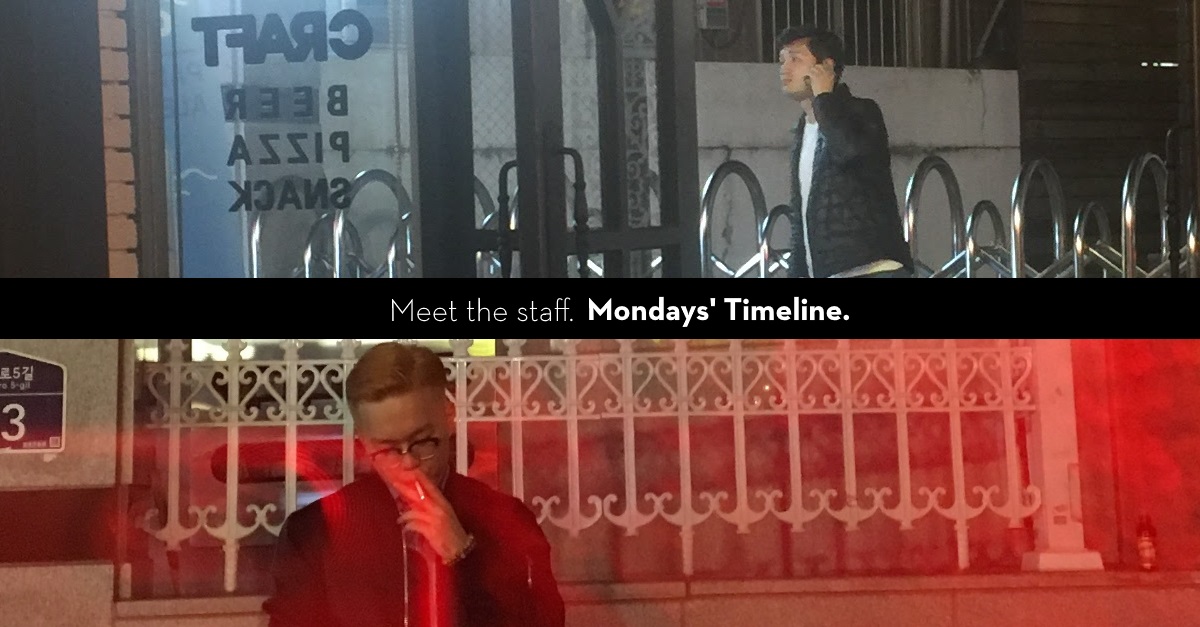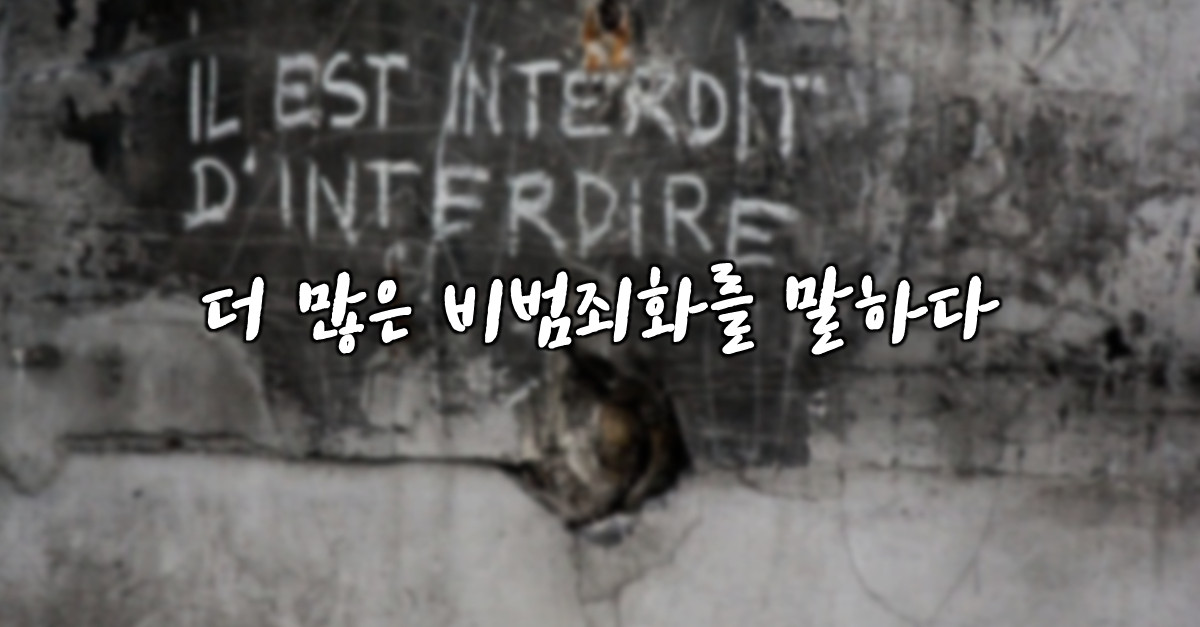매년 있는 어떤 분주함
6월 중순 즈음이 되면 여름 농활에 함께 가자는 포스터가 캠퍼스에 은근히 보인다. 대부분은 그냥 넘기고, 함께 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기껏해야 학생회 몇 명 정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는 졸업 요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면 봉사활동 시간을 왕창 준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 것마저도 딱히 없는 농활의 경우, 참여 인원은 많아야 10~20명이다.

가서는 마을회관을 공짜로 쓴다. 짧게는 3박, 길게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쨍한 한낮을 피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에 농사일을 하고, 새참을 얻어먹는다. 돌아와 밥을 먹고 하루를 정리한다. 집행부가 준비해 온 프로그램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투쟁하기 위해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간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무언가를 또 한다.
이런 농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회 혹은 동아리의 집행부는 적어도 한 달은 꼬박 분주하다. 마을과 연락을 하고, 학교와 농촌의 시기를 고려해 날짜를 잡고, 사람을 모은다.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사정이 있다는 동기와 선후배들을 어르고 타이르며 함께 가자고 부추긴다.?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가는 사람만 가는’ 활동이 되어 버리기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예산과 식단을 짜고 일주일 치의 식재료를 구매한다. 단체 티셔츠도 디자인 해 입고, 프로그램을 짜고 워크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저런 물품도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이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되지 만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충분히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고 불화의 씨앗들이 있다. 단언컨대, 농활 준비는 절대로 쉽지 않다.
조금씩 잊혀지는 어떤 목적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 기간과 소중한 방학의 거의 절반을 날리면서까지 농활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가야 하니까.’ 풀어서 말하면 학생회 혹은 동아리 대대로 내려오는 연중행사에 농활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간다는 말이다. 문득 궁금하다. 그렇게 간 농활에서 그저 농사일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엄마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밥 지어 먹고, 일주일 내내 학교 사람들끼리 붙어 다니면서 친해진 다음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면, 가치 있는 농활은 그걸로 그만일까?

농활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과의 ‘관계맺기’이다. 그곳의 자연, 그리고 농민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가는 것이다. 농촌이 도시의 치열한 리그에서 도태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작동 원리가 도시와 대등하게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 도시와 농촌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라는 것. 문자로 담아내기도 부끄러운 이런 편견들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는 방법은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농활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농민의 수고를 생각하며 밥을 남기지 말자.’ 유치원 때부터 들어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마트에서 비싸기만 하고 양은 적은 유기농 식품을 보며 그 값어치를 이해한 적이 있었던가.?제초제의 힘을 빌어 윤기 나는 오미자가 열린 밭 옆에 있는 “비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풀숲이 되어 버린다”는 유기농 오미자 밭에서 풀을 뽑는 순간,?토마토 농사를 망친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을 함께하다가 작물을 뽑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아주머니와 함께한 순간에, 그 마음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처음 해 보는 수확 작업에 실수가 잦으니 버럭 한 번 하시고 아침 아홉 시부터 소주집에 데려가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던 아저씨.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태우고 일부러 돌아 돌아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계곡에 내려주며 놀면서 천천히 씻으라고 하시던 아저씨를 만났을 때, 말로만 흔히 들었던 시골 인심을 만나게 된다.
우리 손으로 서툴게 차린 마을 잔칫날, 농사일에 대한 애기에서 시작해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로 학교에서보다 더 진지한 토론을 할 때. 나는 그때서야 농민 분들과 내가 한 세계를 공유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농활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 이것이 농활의 묘미구나’를 느낀 것은 그런 관계의 순간에 있었다.

돈 계산도, 학교 행사도, 봉사도 아닌 그 이상의 무엇
올해 농활 때의 일이다. 유독 우리와 잘 지냈던 아저씨가 나에게 얘기했다. “너희, 억지로 오지 마라.” 아저씨 눈엔 우리가 농활을 관성적으로 오는 게 보였나 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고, 너희가 농활을 ‘학과나 동아리의 존속을 위해 참아야 하는 불편한 생활, 불편한 관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로서는 불쾌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반발심이 일어났다. 하지만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친구, 선후배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농사일, 참고 살아야 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관계에는 벽이 생기고 그것은 은연 중에 모두에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어떤 식으로든?그렇게 느끼셨다는데, 그래서 어렵게 그 말씀을 꺼내신 것일 텐데 뻔뻔하게 “에이 무슨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세요” 대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아무런 의미도, 관계도 얻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농활에서도, 총무로서 농활의 마지막 날 당일까지 예산과 공금, 적자에 대해 고민하던 후배는 마지막 날 그 아저씨 집에서 낮술을 마시고 나에게 울면서 주정을 부렸다.
언니가 왜 매년 오는지 알겠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준비할 때 알았더라면 좀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저런 돈 계산만 하다 왔네요.
그 후배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가 느꼈던 이 시간의 귀중함에 눈을 떴다. 그 주정과 같은 눈물은 곧 돈과 시간을 계산하느라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깨달은 순간의 카타르시스일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농활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도 농활을 사랑하는 이유다.

황유라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공방원정대: 안방 1열 탈출기 - 2017년 1월 6일
- W의 오성무가 교수님이라면…? - 2016년 10월 22일
- 통장에 100억이 100만번쯤 찍힌다면 이렇게 써 주마 - 201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