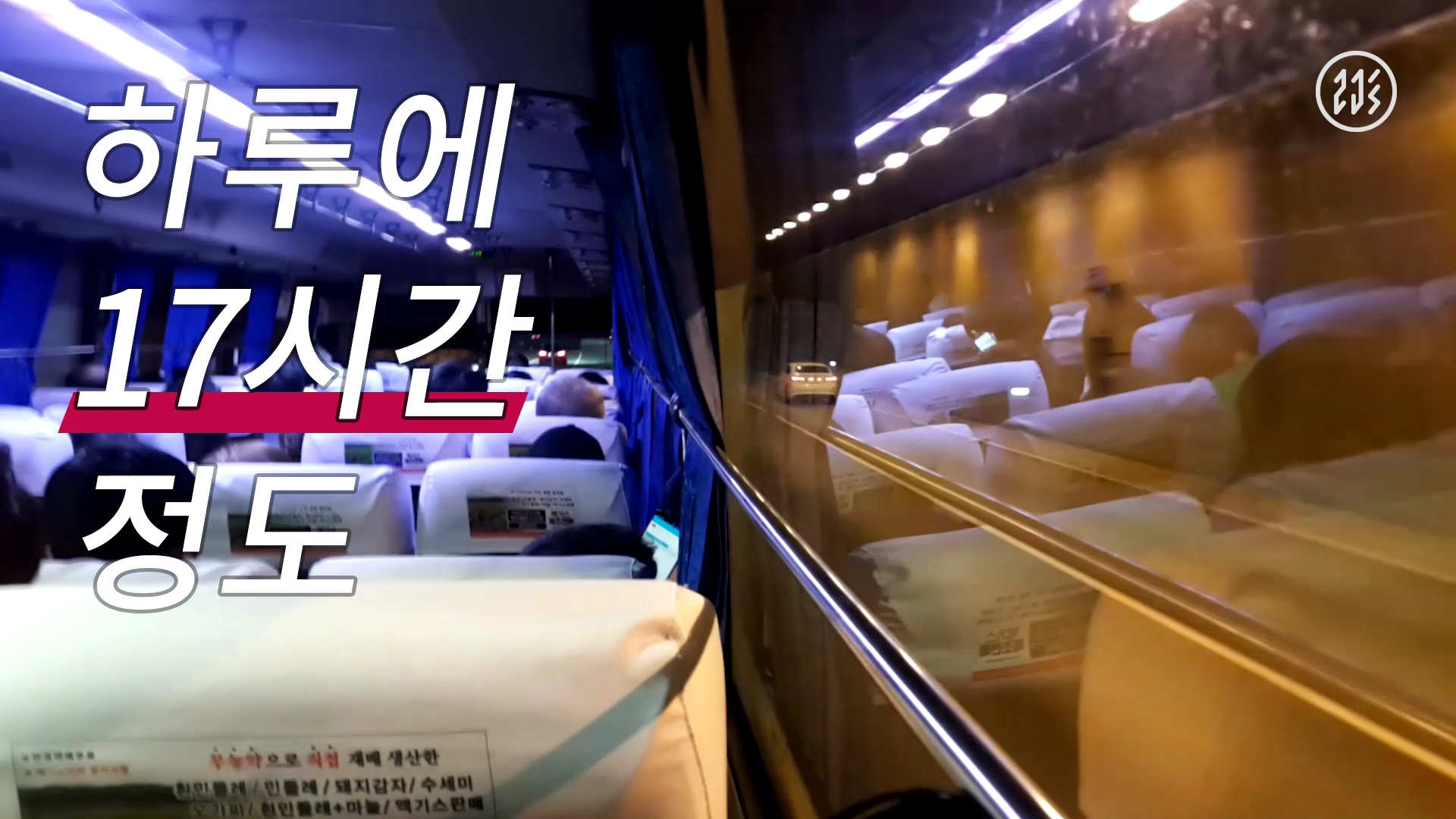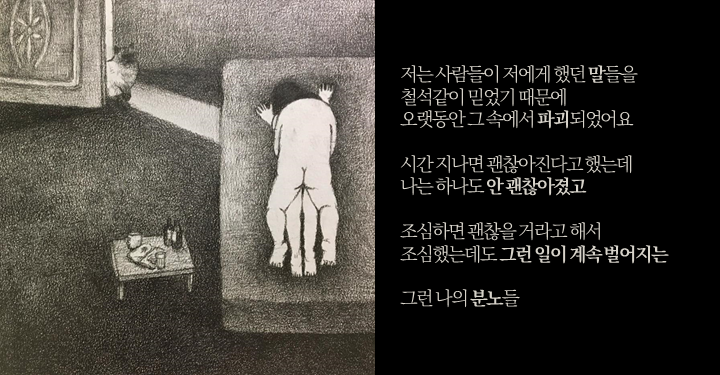스물두 살의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있었다
교내 활동만으로도 2년 반 동안의 학교생활은 충분했지만, SNS를 통해 보이는 다른 친구들은 학교 이름이 아닌 다른 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어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지금도 여전히) 잘 몰랐지만 뭔가 저런 게 스펙인 거 같고, 다들 제 살길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각개전투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감…
나도 어느덧 3학년이었고,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던 ''스포츠 기자''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 구미가 당기는 활동을 찾아냈다. ''스포츠OO에서 후원하는 기자 서포터즈 2기 모집''.
이름 있는 스포츠 신문사에서 대학생 기자를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나를 위한 활동! 뭔가 대박 느낌이었다. 마침 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 1기의 활동 내용을 찾아 참고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공식 페이지는커녕 활동 내용에 대한 간단한 블로그 포스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모집 공고만 검색되었다.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쓴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지?''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일단 나는 지원부터 하고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스포츠OO''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보통의 대외활동 지원서는 그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이 활동은 별 다른 질문도 없이 달랑 이력서 한 장뿐이었다. 출신학교, 가족관계, 자격증, 활동 사항 한두 줄. 나의 열의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어필하기 위해 ''이메일'' 칸에 내 블로그 주소를 썼다. 그 당시 프로야구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주 올리기도 했었고. 쓸 경력이 별로 없는 칸은 합쳐서 ''미래에 스포츠OO에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의지는 강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밑도 끝도 없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지원서를 내고 일주일 뒤 있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활동의 무슨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대충 이러했다. ''유진씨의 이력서랑 블로그를 봤는데, 저희가 찾는 사람인 거 같아서 모집 기간이 남았는데도 바로 연락드렸다. 시간 되시면 오늘 내일 중으로 미팅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와, 나 스카우트 당한건가?''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포스팅이 대단히 전문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나에게 ''아 이거 사기인가?'', ''도대체 이 집단의 실체는 무엇인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속는 셈 치고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면접날까지 기다렸다.
면접은?‘스포츠OO’이 속해있는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의심이 싹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면접은 참 엉성했다. 일단, 면접관은 한 명이었고, 대체 이런 질문들로 어떻게 사람을 고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스포츠 신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문도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10명을 뽑는다는 그 서포터즈인지 기자단인지 모를 활동에 뽑혔고, 그 다음 주에 발대식 현장에 참석했다. 내가 생각하는 발대식은 발랄한 모습을 한 대학생들이 임명장을 받고, 마지막에는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이라는 큰 피켓을 들고 환한 미소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 이런 화사한, 막 그런거 있잖아. ⓒ한국방문위원회
그런데 다짜고짜 모이라고 하더니 건물 옆 치킨 집으로 우리를 주렁주렁 앉혀놓더라. 1기라는 사람들도 대여섯 명 앉아있었다. 2기는 오직 여자들뿐이었고 (내심 대외활동 내에서의 연애도 꿈꾸었건만) 13~15명 정도 되는 어중간한 규모였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소개도 없이, 심지어 자기소개도 없이 그냥 계속 치킨을 먹었다. 눈치를 보다가 마주 앉은 1기에게 무슨 활동을 하셨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의문을 하나도 풀지 못한 채 그렇게 발대식이 끝났고 우리는 대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아무 생각없이 치킨만 먹고왔다.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라는 명목의 모임을 가졌는데 내용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졌다. 그러다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의 스태프로 참여하게 됐다. 기자활동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현장 취재에 대해 질문할 법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에 지쳐 있어 뭐라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는 경호업체에서 나온 분들과 같은 일을 했다. 말이 스태프지 안내 아르바이트랑 다를 게 없었다.
현실을 직시했다. 수당을 받으며 시킬 일에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쓴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청룡영화제’에도 스태프로 투입됐다. 평일 저녁이라 학교 수업을 빠지고 모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린 몇 시간동안 추위에 떨며 행사장 밖을 지켰다. 경호업체 직원의 ‘무슨 일 하는 분들이세요?’라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극한의 추위에 군말 없이 몇 달을 참고 있던 15명의 여성들은 다함께 분개했고, ‘청룡영화제’를 마지막으로 우리 팀은 와해됐다.
‘무엇’이라도 했으면 배우는 것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몇 달 간 바쁜 사람들의 시간만 빼앗았다.
그 활동을 통해 남은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건 사전 조사 없이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누가 계산했는지도 모르는 치킨에 대한 기억. 그 집단의 면접관이 알고 보니 사실 나와 두 살 밖에 차이나지 않는 대학생이었던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모른다.
아아, 유령 같던 나의 대외활동이여.
이유진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솔직히 이 프로는 ‘본방’으로 봐야 제맛 아니냐? - 2017년 1월 16일
- 약속날 Before & After - 2016년 12월 9일
- 솔직히 캔모아도 못 먹어본 애들이 인생을 알겠냐? - 201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