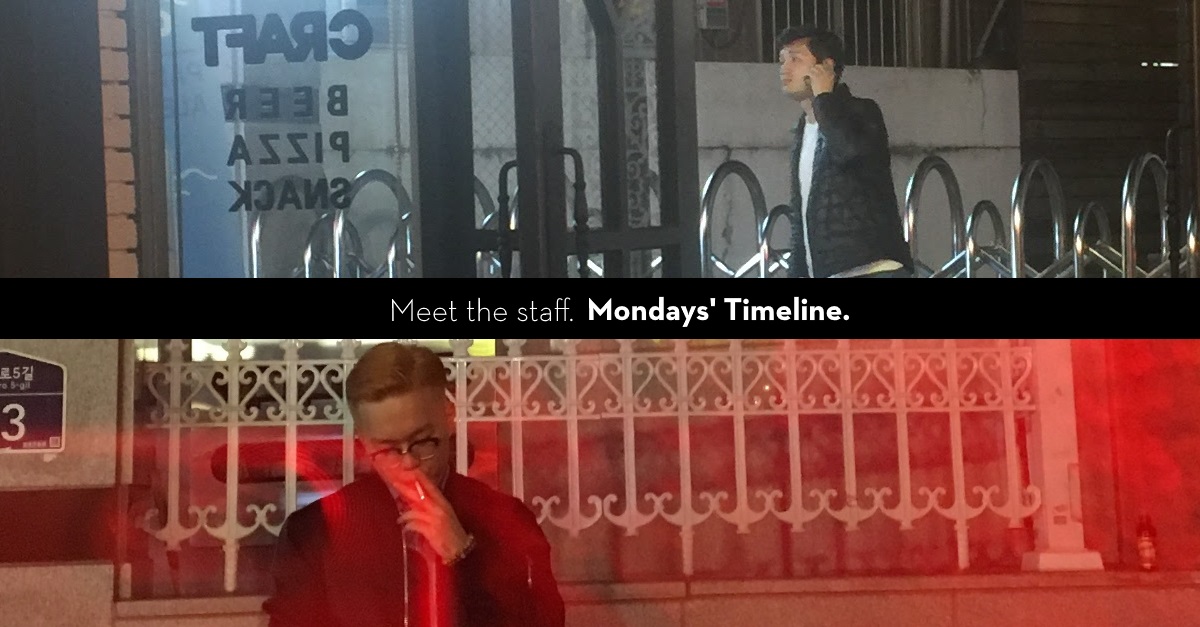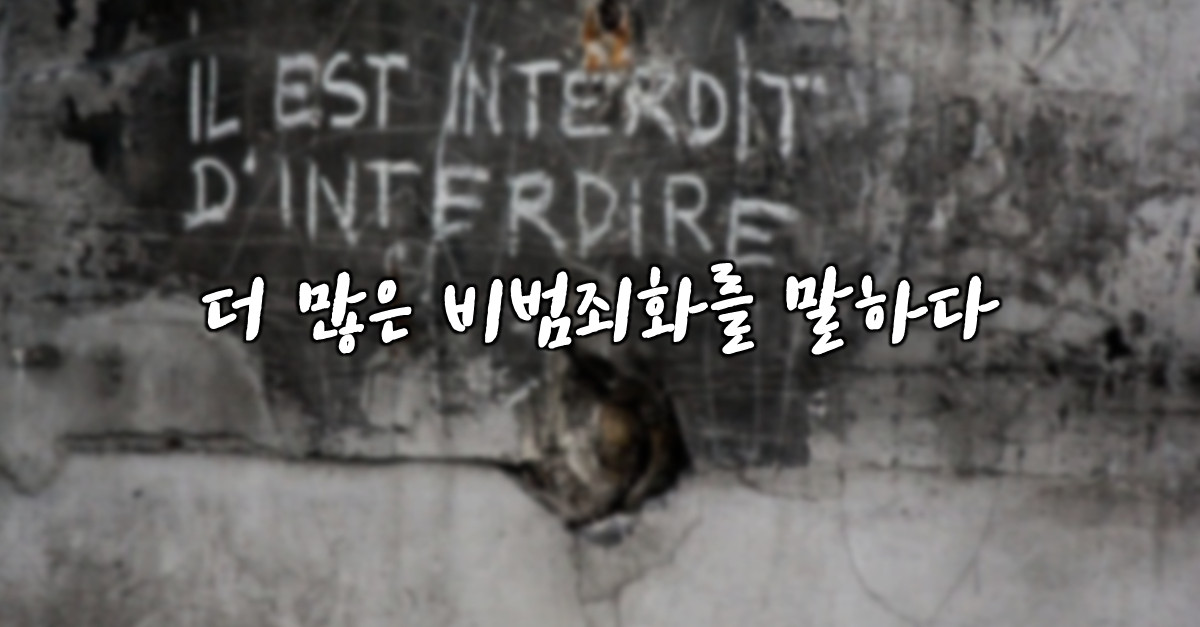내가 아는 수강신청은 약간 재미있는 정도인데
서울 한복판 아스팔트 위에 달걀을 깨면 후라이로 익을 것 같은, 미치도록 더운 올 8월. 하지만 곧 졸업을 앞둔 내게 이 계절은 어딘지 허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매번 이맘때쯤 있었던 내 대학 생활 최고 익사이팅 이벤트가 없어서였던 것 같다. 수강신청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것. 더 이상 플랜 A, B, C를 세울 수도 없고, 눈보다 빠른 손을 믿으며 싸늘한 59분 59초를 기다릴 일도 없다.

싸늘하다. 삼수강생이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시간표는 완벽하니까. ⓒ영화 ‘타짜’
모두가 헤르미온느가 될 것만 같아 쫄려 하는 수강신청을 뭐 그리 아쉬워하느냐고? 난 8학기 내내 수강신청을 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살짝 미끄덩해서 차선을 선택한 적은 있어도, 최악의 시간표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매번 원하는 과목 거의 그대로 주3은 6번, 주2는 2번,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러니 1년에 딱 한 번 오는 생일 마냥 반갑고, 그마저도 더 없다니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내가 수강신청을 하다가 ‘멘붕’ 비슷한 것을 했던 때가 한 번인가 있었다. 2015년도 2학기에, 내가 다니던 학교에, 다른 학교들이 이미 많이들 하고 있었던 장바구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장바구니? 마일리지? 뭐가 이렇게 빡빡해?
여러 대학생들이 알고 있듯, ‘장바구니’ 시스템은 계열과 구분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찾아가는 여정을 할 필요 없이 각자가 희망하는 과목을 미리 모아두는 방식이다. 수강신청이 시작되면 곧바로 장바구니로 가 클릭, 클릭, 클릭.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바구니 하나가 도입됐을 뿐인데 판이 돌아가는 속도감이 차원이 달랐다. 롤을 하다 오버워치로 갈아탄 느낌이랄까. 결과적으로 썩 나쁘지 않은 시간표를 만들긴 했지만, ‘수강 인원이 초과됐습니다’라는 알림창을 내가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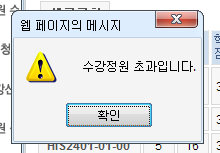
으아니 챠!!!
그때쯤 연세대학교에서 수강신청 제도를 마일리지라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개개인에게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해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 분산 투자하고, 투자한 마일리지의 양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다.?얼핏 보면 모든 걸 학생 개개인의 ‘마우스 컨트롤’에 맡기는 선착순 방식보다는 좀더 나아 보이기도 했다.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강 승인 확률은 올라갈 테고, 그만큼 해당 과목을 절실히 듣고 싶었던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전 학기 고학점 취득자의 추가 학점 수강’이라는 혜택이 여기서는 마일리지 일률 제공 방침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과목에 ‘올인’을 했다가 그마저도 실패하고 마일리지만 전부 날려 먹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한다. 오죽하면 ‘연세대 베팅 마일리지’ 같은 영상이 만들어질까.
이쯤 되면 물음은 좀더 본질적으로 바뀐다.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 가면서 다니는 학교인데, 듣고 싶은 과목을 듣기 위해 꼭 이렇게까지 치열해야 하는 걸까??강의와 교수님의 수는 정해져 있고 학생은 많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학교의 안일함이 낳은 우리끼리의 제로섬 게임
대학교는 학문을 갈고닦는 ‘상아탑’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 전까지 받았던 교육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 특정 대학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좀더 그곳에서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네 수강 신청 풍경을 보면, 과연 정말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그 교육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품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공되는 강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안일한 것이다.

ⓒ조선일보
수강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일반 교양 과목들은 어떻던가? 몇 년이 지나도 같은 과목, 같은 교수, 같은 내용으로 채워진 선택 가능 목록들이 눈앞에 선하다. 전공 과목들 역시 인기가 없거나 있거나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똑같다. 매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무익하게 진행되는 과목은 아무리 강의평가를 통해 올바른 지적을 많이 해도 꿈쩍도 않고 다음 학기에도 ‘하나의 선택지’로 올라오며, 인기 있는 과목은 아무리 지난번 경쟁률이 높았어도 분반 편성 같은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역시 ‘단 하나의 선택지’로 올라온다.
인기가 있건 없건, 수강생들이 어떻게 느꼈건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선택지’로 올려 놓고 알아서 골라 가라고 하는 지금의 수강신청 체제를 보면, 대학 교육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학생이라는 고객의 전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쉽게 말해서, 선택하기 싫은 것과 턱없이 부족한 것의 두 가지 선택들만이 가득한 게임을,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해마다 두 번씩 대대적으로 치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자! 편을 갈라 싸워 봐!” ⓒ경향신문
물론,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학기마다 수많은 강의를 만들고, 없앨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런 방향이 삐뚤어지면 지금도 스멀스멀 진척되고 있는 프라임 사업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어그러진 판을 만들어 놓은 채, 듣기 싫은 과목을 피하고 싶으면 알아서 치열히 경쟁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는 식의 운영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수강 신청이 인터넷 속도와 클릭질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발표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린 원하는 학문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훈련하러 대학에 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결국, 나는 앞서 언급했던 수강 신청 때문에 처음 멘붕을 겪은 학기에 B 플랜으로 있었던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됐었다. 그 수업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거기까진 그렇다 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같은 교수의 기나긴 연설로만 매주 진행되는 수업은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실질적으로 글쓰기에 관해 좀 더 알고, 또 그것을 터득하여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뭘 배웠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16주는 그렇게 지나갔다.

사실 한 가지는 잘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을 보니,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면 수업과 크게 관계없는 썰만 잔뜩 풀면서 제멋대로 굴어도 딱히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었다.
나만 해도 그랬는데, 하물며 수강 신청에서 완벽한 패배자가 된 이들은 어떤 기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우린 그 문제를 지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 체제의 안일함을 받아들이고, 매년 두 번씩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니터 앞에서 괴상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가려진 채로.
김정원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일일드라마 ‘여의도 사람들’ - 2017년 5월 8일
- [대마 비범죄화론] ② 이센스가 어긴 것은 20세기의 법이었다 - 2016년 10월 24일
- [가지는 취미를 갖자] ② (가성비 짱짱의) 스티커 - 201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