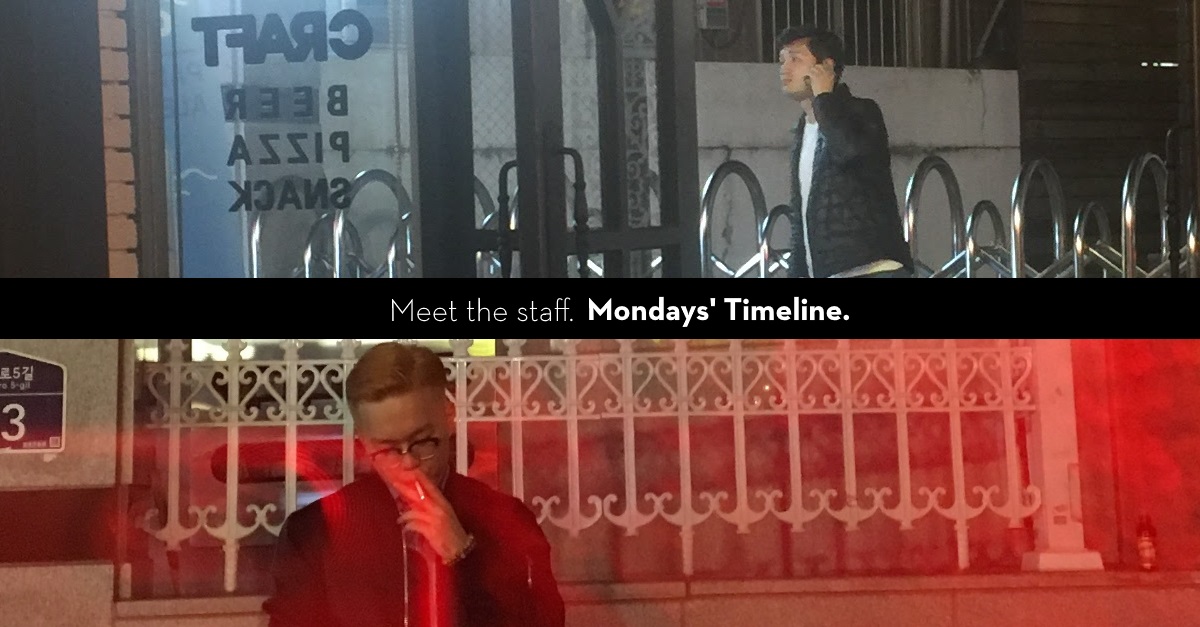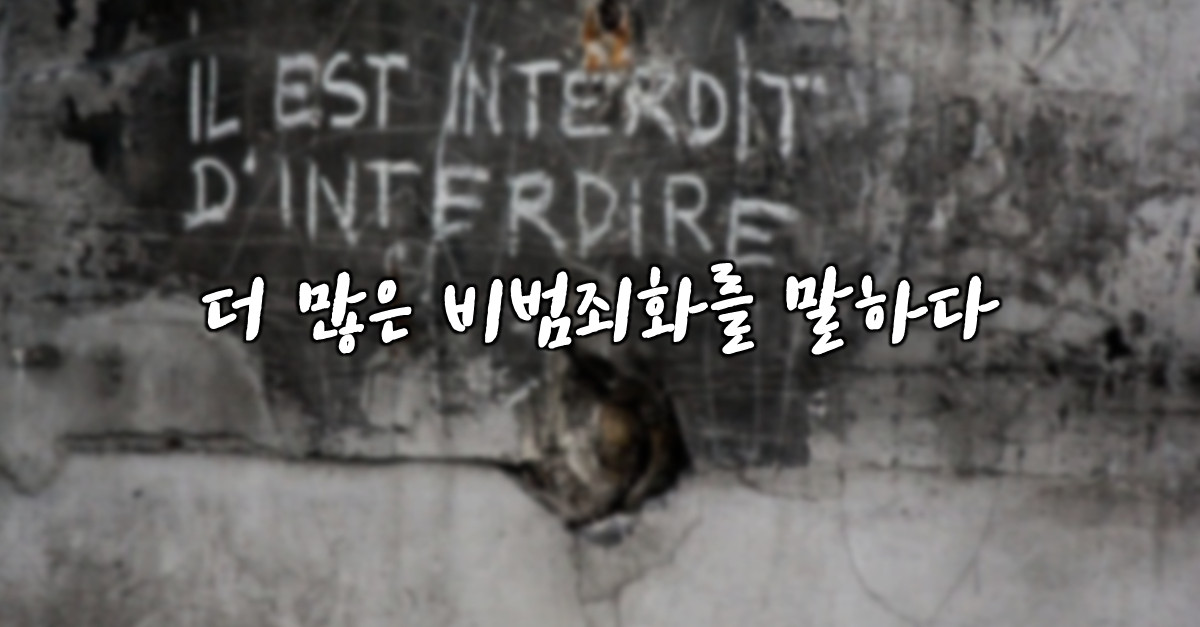"나는 ㅇㅇ
기획의도
말했듯, 이번 주 먼탐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술 얘기다. 여기서는 ‘누구와 어떨 때’ 마셨을 때 즐거웠다거나 의미가 있었다거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소개한다. 읽고 나서 여러분의 음주가무 이력을 되돌아봤을 때, ‘음 아주 허송세월은 아니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1. 월말 : 잔고가 천원 단위일 때?(by Y)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월말만 되면 통장이 아주 ‘텅장’이다. 꼭 그럴 때 술이 마시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술자리에 얻어먹으러 나갈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에 딱 하루, 그것도 내 남은 전 재산 안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용을 낼 수 있는 밤은 어디 가야 만들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된다.?누구와 어떤 술을 어느 장소에서 마실지 한참을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카톡 친구를 두 바퀴쯤 돌려보다, 결국 그냥 매일 보는 동네 친구와 매일 가는 술집에서 매일 먹는 술과 안주를 먹는다. 알고 있는 가격,?익숙한 분위기, 흔한 안주. 딱히 새롭거나 대단한 것은 없다. 근데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월말이라서 그런지 술 생각이 간절해서 그랬는지, 한 달 중 가장 단 술이 이때 여기 있으니까.
2. 엄마랑 같이 : 술에 대한 지론을 들으면서 (by S)
우리 엄마는 술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다. 일단 1300원짜리 소주는 술이 아니다. 그건 공업용 알코올에 물을 섞어놓은 것일 뿐이다. 당신이 직접 전통주 공방까지 가서 술 뜨는 법까지 배워오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의 확고한 기준에 따르면 도수가 낮은 술도, 과실주도 술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발효된 주스거나 소화제거나 감기약인 것이다. 그리고 어린애가 아플 일이라곤 배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자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

가끔 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엄마 이거 술 아니에요?” 하면, 엄마는 늘 “이건 그냥 주스지. 몸에 좋으니까 다 마셔” 하셨었다. 그 효소인지 주스인지 하는 건 참 묘해서 금방 얼굴이 빨개지던 엄마의 애인이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만 마셔요” 하고 엄마한테 꾸중을 들을 땐 또 술이 되었다. 그러고 날 한 잔 더 주면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는데. 술 한 잔이 그렇게 다정하고 맛있고 든든한 것이었단 걸 요새는 자주 잊는다.
3. 새벽 시간 : 자전거도로 조깅로에서 (by J)
서울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도로가 5분 거리에 있다.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라 만만하게 생각하고 동네 친구들과 모여 논 적이 꽤 많았었다. 그 숱한 추억들 중에서도, 술인지 물인지 싶은 500짜리 국산 맥주를 친구들끼리 한 캔씩 마시며 조깅로를 느릿느릿 걸었던 적이 있다. 모두가 바쁘게 놀러 나갔거나 잠시 후 문 닫는 술집 앞에서 파하고 있을 금요일 밤 1시에, 조용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둘이 어딜 달리 가겠는가.

우린 30분에 한 명씩이나 눈에 띌까 말까 한 어두운 그 길 위에서 그날의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는다. 곧 맞이할 복학에서 오는 기대감,?동시에?엄습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 애인을 향한 그리움 등등…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 지치면 강물이 보이는 아무 바위에나 나란히 앉는다. 그 강물은 딱히 깨끗하지 않고, 그런 대화는 딱히 무슨 답을 내놓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그 고요한 순간에 살짝 드는 취기를 사랑한다. 술을 만땅으로 마시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장 왜곡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롯이 거기에 있으므로.
4. 개강 날 : 간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과
1~2학년 때는 “개강 파티” 따위를 왜 하는지 몰랐다. 방학 때도 마시고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마시는 걸 왜 개강 기념으로 또 마시지? 솔직히 간을 좀 쉬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밖에 없던 때였으니까. 그러나 이윽고 복학과 휴학이 서로 엇갈리는 5학기쯤을 넘어서니, 이제 개강날은 반가운 얼굴이 보이고, 흥이 나기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그때 땄던 소주병 뚜껑을 모두 모아서 모빌을 걸고 나왔다. 참 재미있었다.
그래서 따로 ‘단톡방’을 파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동기들이 한두 명씩 붙더니 무려 열댓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찾아간 학교 뒷골목은 참 훈훈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학 내내 고요했던 동네가 하루 만에 꽐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지, 나만 쓰레기가 아녔어.
5. 누가 사주는 술 : 그것도 사장님이 (by S)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보니 이제는 알바를 할 때 늘 ‘내가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끔 힘든 게…

이런 걸 얻어먹어 놓으면 ‘을질을 하자’는 그동안의 다짐이 그냥 스르륵 녹아 버리는 것이다.
술 중에 제일은 꽁술이라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다. 내 돈 들고 술 마시러 왔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 내 앞에 짠 하고 있으니 이 알바를 시작한 과거의 내게 두 손 모아 칭찬을 해 줄 수밖에 없다.?사장님이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마셔! 하실 때 술 냉장고 앞에 옹기종기 붙어서 군침 삼키며 뭘 마실까 고르는 것도 좋다.?어린 시절 아빠랑 같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아빠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 와! 했을 때의 기분이 향수처럼 묻어나는 행복감.
늘 연봉깨나 되어 보이던 아저씨들한테 팔던 술을 나도 마셔 본다는 행복감.?그런 소소한 행운이 주는 위로 덕분에, 지친 몸을 끌면서도, 다른 알바랑 재잘대고 깔깔대며 집에 간다.
Twenties Timeline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모두 보기)
- 누군가의 ‘죄송한 죽음’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 - 2018년 5월 28일
- [9th 모집 D-DAY] 어떤 대학생이 1년이 넘도록 트탐라를 하는 이유 - 2017년 12월 29일
- 가깝고도 낯선, 가족이라는 그 이름 - 2017년 12월 28일